|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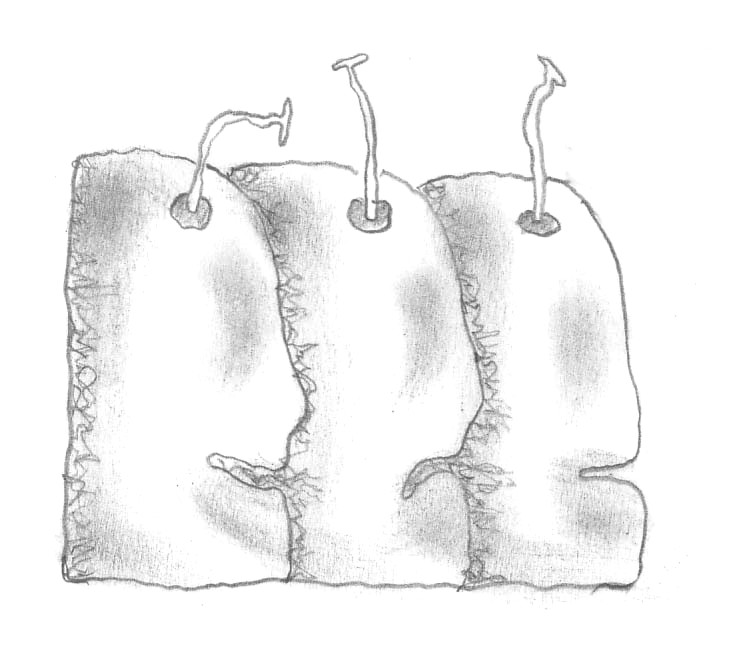
글 : 최우일 (캘거리 교민)
열 두번째 잡담에서 나는 그늘에서 나와 모습을 들어내자, 어떤이는 “누군가 했더니 바로 당신이였군” 하며 아는체를 해주었습니다. 익명이던 실명이던, 나야 바뀔 일이 없겠지만, 사실 내 심사가 전과 같지 만은 않은 것은 공개되고 나서의 조심스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떻든 이번 일로 나에 대해서, 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내게 큰 수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서울 가는 비행기의 밀폐된 공간 속에서 서로 속모르는 낯선이들에 섞여 있을때면 이상한 해방감을 느끼곤 합니다. 자신을 들어낼 필요없이 여럿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날라가다가 아무런 부담없이 종내 헤어질 사람들, 만일의 경우가 생긴다면 운명도 같이해야 할 각오까지도 되어 있는 공동운명의식을 가지고서도 사려야 할 일도, 나를 속속드리 노출시킬 까닭도 없으니 약간은 우쭐한 기분도 들고 친근감도 생기고 공연히 너그럽게도 되며, 급기야 홀가분한 기분이 듭니다.
마치 작은 시골 생활에서 보다는 밀집한 도시에서라야 본색을 감추고 개인인 내가 보장될 때 오는 자유스러움이라고나 할까? 부락집단에서처럼 살짝 넘어 일일이 간섭받아 불편하고 피곤할 수 밖에 없던 것이 도시의 군중속에서는 나를 묻고 허명이나 행세 따위를 포기할 자유를 자유스레 행사하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뵈는 모습으로 살기도 쉽기만 합니다.
옛날에 있던 우리의 탈은 그것의 주술적의미 말고도 괄시받아 변변치 못한 천민들이 얼굴을 가리고 한바탕 까불어 볼수도 있었고, 지금 세상에서는 체면 깍일 일 없이 슬쩍 나를 노출시켜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선 나를 들어 내 놓고서는 어림도 없는 짓들이 거침없어, 내맘인데 누가 뭐랄 것이냐는 태도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린다고 해서 다 감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옛의 탈이나 지금의 인터넷이나 제눈만 가린다고 벌거벗은 수치를 까맣게 모르는 어리석음이 아닐까 합니다. 보통 같으면 남에게 보이고 싶지않은 부끄러운 부분을 들어내어서 만족하는 괴상한 도착증세, 남의 주의를 끌어 칭찬을 바라는 이상성 감정, 이런것은 노출증 환자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꽁꽁 감출 것이나 있는가 생각하게 합니다. 감추는데는 감출만한 어떤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나무의 열매 같으면야 익어가면서 속의 것이 단단히 여물어 씨가 되기까지는 잘 감추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사과의 의미는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과육에 있으므로 모양과 색깔을 내고 향과 맛을 돋구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도 인품이란 꽁꽁 숨겨두고 마는 어떤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나라는 것도 따로 뚝 떨어져 있는 본래의 무엇이 아닌 것이, 한겹 한겹 벗겨내도 알맹이는 나타나지 않고 하나하나 꺼풀들이 쌓여뭉쳐 그 전부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나에게의 집착을 버리는 것은 어쩌면 수행의 첫출발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건 정말 대오각성이라는 큰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황 석영씨의 ‘장길산’ 이란 도적놈 얘기를 읽다가 이런 일화하나를 얻었습니다. “내가 건망증이 들어 아내가 누구인지 집이 어디인지 다 잊어 버리고 이웃에 마실 나왔다가 영영 집을 찾아 돌아가지 못하고 말았소. 어디엔가 발길이 멎어야 할 텐테 내가 소중히 하던 담뱃대를 잃어버리고 그걸 찾느라 백리길을 헤매이었으니… 그냥 걸었지. 헌데 실상은 내 오른 손에 그것을 꼭 쥐고 있었단 말야. 걷노라면 팔이 앞뒤로 휘어지거든. 팔이 뒤로가면 ‘내 담뱃대 어디로 갔나?’ 하였다가 다시 팔이 앞으로 나올 때 ‘여기 있구나’하며 내쳐 길을 걷는데 잃었다 찾았다가 분간이 되어야지. 그러다가 중과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자가 내 짖거리를 눈여겨 보다가 내가 잠든새 크게 깨닫고서는 이 녀석의 건망증은 이제 나을 것이고 나는 대오각성하였구나’ 그랬다지. 중이 내 머리를 깍아 버리고 제 승복을 내게 입혀놓고는 휘적휘적 걸어갔소. 그때 내가 뭐라했는지 아시오? ‘어라, 같이자던 중만 여기있고 나는 어딜 갔나?’ 그러고 보니 앞에서 누가 걸어가더란 말이야. 나는 소리치며 쫓아갔지. ‘옳지, 내가 저기 있나보다. 여보, 거기가는 사람… 혹시 나 아니우? 헌데 아무리 쫓아가도 내가 잡혀야지. 고개를 넘는 사이 나는 어디론가 달아나 버려서 영영 놓치고 말았고. 그래서 중만 남았기에 하는 수 없이 절을 찾아갔지.” 이게 내가 나는 잃고 남이 되버린 내력이오.
누가 뭐라든 꼼짝없이 붙들고 놓칠 수 없는 나란 실은 허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있지도 않은 나를 감싸려 애쓸 까닭이 없습니다. 진실같아 보이는 것도 어찌보면 복잡하기만 했지, 허실임을 깨닫고 보면 이리도 간단한 것을…
그러나 한가지 늘 새겨 둘 것이 있습니다. 이름에 가려서 내게는 잘 보이지 않는 구석이 있습니다. 나의 뒷모습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남에게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 뒤에 있다는 걸… 뒤통수가 따끔거리고 쑥스럽고 뭔가 머쓱한 기분이다. 뒷모습은 정작 본인인 나는 보기가 힘든 모습인데 거울 두개로 이리저리 비추고 목을 돌리고…그런데, 다른 사람은 내 뒷모습을 너무도 쉽게 본다.” 양 윤경이라는 이가 인터넷에 올린글을 허락도 없이 이렇게 옮겨 적어 보았습니다. 실속없는 허명이란 이런 것입니다. 꼭 보아야 할 곳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옛날 아주 옛날로 거슬러가보면, 지금과는 달리 십리길이 동네를 밖의 세상과 격리시키던 폐쇄된 사회에서는 어디사는 누구라던가 대대 가족의 생업이 무엇이라던가 또는 그런집의 아들 누구라고 하는 것만으로 개인을 분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그것이 바로 그들 개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글을 읽고 쓰지 못하며 살았고 소수의 해독자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판권이다 저작권 따위, 아니 아예 말을 남기는데 꼭 이름을 밝히려고 기를 쓰고 나서지 않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나 내가 뒤바뀌어서 헷갈릴 일이란 없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맘에 안들면 벗어던지고 새것으로 바꾸는 일이 쉬운 세상에서 시원찮는 이름 하나 팽개친다고 해서, 지금처럼 너따로 나따로 하는 세상에서 나따로 내 이름 따로 겉돈다고 해서, 특히 북미주처럼 내이름 그럴듯이 포장못해 상품가치 없고 이름 장사 잘못해서 교만하다 남의 구설에 오르내린다고 고까워 할일도 없겠습니다.
편집자 주) 본 글은 CN드림 2003년 11/14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4 CNDream.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