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 본제입납
- 어느 실직자의 편지
봄은 땅을 지펴 온 산에 꽃을 한 솥밥 해 놓았는데 빈 숟가락 들고 허공만 자꾸 퍼대고 있는 계절입니다
라고 쓰고 나니
아직 쓰지 않은 행간이 젖는다
벚꽃 잎처럼 쌓이는 이력서
골목을 열 번이나 돌고 올라오는 옥탑방에도
드문드문 봄이 기웃거리는지,
오래 꽃 핀 적 없는 화분 사이
그 가혹한 틈으로 핀 민들레가 하릴없이 빈둥거리는 봄볕과 일가를 이루고 있다
꽃들이 지고 명함 한 장 손에 쥐는 다음 계절에는 빈 손 말고
작약 한 꾸러미 안고 찾아 뵙겠습니다 라는 말은
빈 약속 같아 차마 쓰지 못하고
선자의 눈빛만으로도 당락의 갈피를 읽는 눈치만 무럭무럭 자라 빈한의 담을 넘어간다 라고도 차마 쓰지 못하고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다 그치는 봄날의 사랑 말고 생선 살점 발라 밥숟갈 위에 얹어 주던
오래 지긋한 사랑이 그립다 쓰고
방점을 무수히 찍는다. 연두가 짙고서야 봄이 왔다 갔음을 아는
햇빛만 부유한 이 계절에,
* 본제입납(本第入納) :
자기 집에 편지할 때에 겉봉 표면에 자기 이름을 쓰고 그 밑에 쓰는 말
- 허영숙
경북 포항 출생
釜山女大 졸
2006년 <시안> 詩부문으로 등단
시마을 작품선집 <섬 속의 산>, <가을이 있는 풍경>
<꽃 피어야 하는 이유>
동인시집 <시와 그리움이 있는 마을>
시집, <바코드 2010> <뭉클한 구름 2016> 等
---------------------------
<감상 & 생각>
본제입납(本第入納), 아니 본가입납(本家入納)이라 할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같은 내면화의 풍경이
군더더기 없이 정갈하게 묘사된 느낌입니다
이 시를 읽으니 (꼭이 부제 副題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 역시 IMF때 실직을 하고 몇년인가 뜬 구름처럼 헤매이던 그 어느 해
뼈속까지 차가웠던 봄날도 생각납니다
그때는 화사한 봄빛마저 시퍼런 작두를 들고 달려드는 느낌이었죠
생경(生硬)한 봄풍경의 아픔을 단순히 개인적인 것으로 삼는 것을 넘어,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해 모든 게 더욱 더 황량해지기만 하는 이 시대의 아픔이
곧 우리 모두의 아픔임을 의미하고 있는 연대감(連帶感) , 그 소중함 같은 것
- 오늘도 실직자들은 사방을 떠돌고.. 매일 우수수(憂愁愁) 자살하는 사람들
뭐, 그래도 봄이라는 계절은 그런 인간사(人間事)와 하등 관계없이
저 홀로 너무 눈부시어 마주 볼 수 없고..
하지만, <봄>이라는 또 하나의 주제를 갖고 어둠과 빛이 서로 몸을 섞듯한
심상의 나래를 펴는 백일몽(白日夢)의 세계에
화자(話者)의 현실 내지 어둠을 때로는 꿈꾸듯이, 때로는 처연(悽然)하게
서정적 언어로 형상화하고 있음이
그 언젠가는 빛을 볼, 방점(傍點)찍힌 개화(開花)의 꿈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 희선,
梨花雨 흣뿌릴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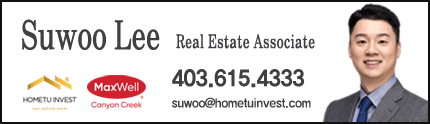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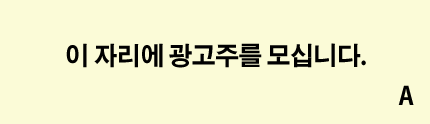
아픔이 더 커지는것 같습니다.
고향의 들려오는 소식은 腐敗無能 -> 無能腐敗으로
바뀌었다는 막막한 소식만 들립니다.
차라리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희망이라도 주지 않았으면...
지 "금고" 빈곳만 알고,
배고픔을 모르는 저들을 벌하소서...
Utata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