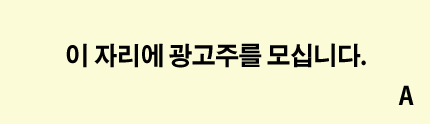배달이 일상이 된 도시, 한국·캘거리 라이더의 오늘 - 한국, 배차·산재 기준 이슈 지속, 온타리오 권리법 도입, 앨버타 자율 유지

우버이츠 배달라이더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배달라이더들이 교통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정화 기자) 한국과 캘거리에서 배달 서비스는 일상이 됐다. 비슷한 플랫폼을 쓰지만 한쪽은 정책 논쟁의 중심에 서 있고 다른 한쪽은 개인 선택에 맡겨진 구조가 이어진다. 배달노동을 바라보는 두 사회의 온도 차가 현장의 현실을 갈라놓고 있다.
■ 캘거리 배달라이더, 선택의 자유와 불안정의 공존
캐나다에서는 약 70만 명이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캘거리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는 Uber Eats, DoorDash, SkipTheDishes가 대표적인 배달 플랫폼이다. 라이더들은 자차·자전거·스쿠터 등을 활용해 주문을 소화한다. 이런 구조는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주고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허용한다.
이런 특성에도 수입의 불안정성은 여전하다. 배달 수당은 주문당 액수와 팁, 프로모션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또 고정 임금이 없어 월소득이 들쑥날쑥한 점은 다수 라이더와 연구에서 반복 지적된 부분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피크페이(Peak Pay)가 없을 때는 수입이 크게 떨어진다”는 라이더 경험담이 공유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활용하는 멀티 앱 전략이 일반적이다.
캘거리에서는 라이더가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집단행동이나 노조 조직화는 드물다. 이 때문에 수입 변동성과 보호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올해부터 플랫폼 소득에 대한 국세청(CRA) 보고가 본격화됐고 온타리오주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권리법’을 시행해 보상 산정 방식 고지와 최소 임금 기준을 의무화했다. 앨버타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아 캘거리 현장에서는 유연성과 소득 불안정이 공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 한국 배달라이더, 보호와 보상을 둘러싼 갈림길
한국에서는 배달 한 건이 산업과 노동 이슈로 이어진다. 빠른 배송과 높은 주문량을 토대로 성장한 시장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산업화됐다.
라이더들은 플랫폼 초기부터 산재 보상과 안전 기준, 수수료 구조를 둘러싼 공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배달 사고 발생 시 산재 인정 기준이 엇갈린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런 흐름 속에서 노조를 중심으로 집단 행동도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내년 도입이 예고된 새 배차 시스템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라이더의 위치와 수행 이력을 반영해 주문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일부 라이더들은 알고리즘이 수입과 노동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정성을 요구한다. 생계형 라이더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주문량 대비 수입 감소를 체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논쟁의 온도차는 소비자와 라이더의 체감에서도 드러난다. 캘거리에서 주 3회 이상 배달앱을 이용한다는 워홀러 A씨는 “여기서는 그냥 음식이 오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진다”며 “배달하는 사람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지는 잘 생각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캘거리에서 직접 배달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C씨도 “팁이나 프로모션으로 수입을 보완하는 구조는 비슷하지만 한국처럼 제도 문제로 공개적인 논쟁이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처럼 캘거리에서는 개별 라이더의 자율에 맡겨진 유연한 구조가 도드라지고 한국에서는 노동 조건과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선명하다. 같은 플랫폼이라도 노동을 바라보는 제도와 기준 차이가 서로 다른 현실을 만든다. 플랫폼 노동이 일상이 된 지금, 라이더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보완할지는 두 도시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