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캘거리에서 화이트호스까지는 편도 2260km입니다. 비행기는 밴쿠버 경유로 해서 갈수 있구요
차로 간다면 인근에 있는 스캐그웨이(미국)까지 드라이브 하는것도 좋습니다. 그곳까지의 경치가 아주 좋죠.
아니면 알래스카를 가는 길에 들르면 좋을듯 싶네요
스캐그웨에와 유콘주에 대한 사진모음 게시물입니다.
혹한의 땅, 캐나다 북부 소도시에 예술가 몰리는 까닭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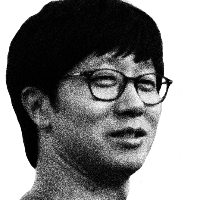 최승표 기자
최승표 기자
지난해 12월, 캐나다 유콘의 화이트호스로 오로라를 보러 갔다. 기대했던 대로 초록빛 밤하늘은 가슴 저릿한 장관이었다. 의외로 오로라를 보지 않는 낮에도 할 게 많았다. 개썰매, 스노슈잉, 온천, 야생동물 관찰도 흥미로웠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람이었다. 겨울이면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지는 날이 흔하고, 하루 18시간이 깜깜한 도시는 사람 덕분에 차갑지 않았다. 그림을 그리고, 공예품을 만들고, 함께 노래 부르며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을 곳곳에서 만났다.


키 작은 형형색색의 건물이 모여 있는 화이트호스 다운타운은 앙증맞다. 오죽하면 1940년대에 지은 3층짜리 목조건물을 ‘마천루’라 부를 정도다. 틈날 때마다 거리를 산책했는데 그라피티가 건물마다 화려했고, 갤러리도 유난히 많았다. 갤러리에는 어김없이 오로라와 근사한 자연을 묘사한 그림이 많았다. 일본인 가이드에게 “화이트호스에는 화가들이 많은가 봐요?”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 “워낙 추운데다 밤이 기니까 할 일 없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닐까요?”

가이드의 설명이 틀린 건 아니지만 야스 야마모토 유콘관광청 아태지역 매니저의 설명이 설득력 있었다.
“뾰족뾰족한 로키산맥과 달리 온순한 산세, 밤마다 하늘을 장식하는 오로라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죠. 비록 춥긴 하지만 스트레스받을 일 없고 느긋하게 살 수 있으니 예술가에겐 최적의 조건 아닐까요? 그래서인지 여행을 왔다가 반해서 눌러앉은 예술가가 유독 많습니다.”
세계에서 1인당 커피 소비량이 가장 많은 핀란드처럼 화이트호스 사람들도 커피를 많이 마신다.(화이트호스와 핀란드 헬싱키는 위도가 같다. 북위 60도.) 비록 서울처럼 자정까지 영업하는 카페는 없지만 맛난 커피를 파는 집이 많다. 흥미로운 건 카페마다 어김없이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는 사실. 어느 아침, ‘번 토스트 카페’에서 자신의 작품을 걸고 있는 화가 맬란카 토퍼를 만났다. 그는 “카페나 식당 주인이 예술 작품 전시에 호의적”이라며 “화이트호스는 공동체 문화가 강해 예술가들이 교류하고 서로 돕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화이트호스의 역사를 전시한 맥브라이드박물관에서도 미술품을 감상했다. 캐나다 대표 화가인 테드 해리슨의 작품이 단연 눈부셨다. 영국 태생인 해리슨은 25년간 유콘에 살았는데 특유의 단순하면서도 세련미 넘치는 화법은 모두 유콘의 자연과 사람에게 받은 영향이었다고 한다.


박물관 1층 천장에는 긴 깔때기 모양의 유리 공예품이 전시돼 있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인근 유리공예 스튜디오에서 만든 작품이라며 꼭 들러보라고 했다. ‘루멜 스튜디오’를 찾아갔다. 캘거리 출신의 20대 예술가들이 뜨거운 가마에서 달궈진 유리로 가지각색의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이들은 “예술가에게 우호적인 도시 분위기와 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때문에 화이트호스로 왔다”고 말했다.


미술 만이 아니었다. 근사한 공연도 있었다. 싸고 맛난 커피를 파는 ‘베이키드 카페’에서 무료 공연을 한다길래 찾아갔다. 공연 시작 전, 관계자가 “주민이나 오는 소박한 행사인데 아시아 여행자가 와줘서 정말 고맙다”며 인사를 건넸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밤, 지역 음악인들이 피아노·바이올린·어쿠스틱 기타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올드 재즈부터 샹송, 익숙한 캐럴까지. 관객들은 나지막이 노래를 따라 하거나 가볍게 몸을 흔들었다. 더러는 와인을 마시며 눈 감고 지긋이 노래에 취했다. 차가운 북위 60도 도시에서 보낸 가장 따뜻한 밤이었다.


북위 60도에 자리한 캐나다 화이트호스는 오로라 외에도 즐길거리가 많은 도시다. 작은 도심을 산책하며 그라피티나 아기자기한 갤러리를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최승표 기자

화이트호스는 오로라 관광으로 유명하다. 오로라와 근사한 자연에 반해 정착한 예술가도 많이 산다. 최승표 기자
북위 60도 유콘 준주 화이트호스
오로라, 포근한 산세가 영감 원천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도 한몫
여행 왔다가 정착한 예술가 많아
거리마다 그라피티·갤러리 즐비

언덕에서 내려다본 다운타운. 화이트호스에서는 3층만 돼도 고층 건물 축에 든다. 최승표 기자
가이드의 설명이 틀린 건 아니지만 야스 야마모토 유콘관광청 아태지역 매니저의 설명이 설득력 있었다.
“뾰족뾰족한 로키산맥과 달리 온순한 산세, 밤마다 하늘을 장식하는 오로라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죠. 비록 춥긴 하지만 스트레스받을 일 없고 느긋하게 살 수 있으니 예술가에겐 최적의 조건 아닐까요? 그래서인지 여행을 왔다가 반해서 눌러앉은 예술가가 유독 많습니다.”
세계에서 1인당 커피 소비량이 가장 많은 핀란드처럼 화이트호스 사람들도 커피를 많이 마신다.(화이트호스와 핀란드 헬싱키는 위도가 같다. 북위 60도.) 비록 서울처럼 자정까지 영업하는 카페는 없지만 맛난 커피를 파는 집이 많다. 흥미로운 건 카페마다 어김없이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는 사실. 어느 아침, ‘번 토스트 카페’에서 자신의 작품을 걸고 있는 화가 맬란카 토퍼를 만났다. 그는 “카페나 식당 주인이 예술 작품 전시에 호의적”이라며 “화이트호스는 공동체 문화가 강해 예술가들이 교류하고 서로 돕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다운타운 카페에 자신의 작품을 전시 중인 지역 화가 맬란카 토퍼. 화이트호스에는 자신의 작품을 기꺼이 걸어주는 카페가 많다고 했다. 최승표 기자
끈끈한 예술가 커뮤니티

캐나다 대표화가인 테드 해리슨의 작품. 그는 25년간 유콘에 살며 자연으로부터 깊은 영감을 받았고 그만의 독특한 화법을 완성했다. 최승표 기자

맥브라이드박물관 1층 천장을 장식한 유리공예품. 오로라를 형상화한 듯 했다. 최승표 기자
박물관 1층 천장에는 긴 깔때기 모양의 유리 공예품이 전시돼 있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인근 유리공예 스튜디오에서 만든 작품이라며 꼭 들러보라고 했다. ‘루멜 스튜디오’를 찾아갔다. 캘거리 출신의 20대 예술가들이 뜨거운 가마에서 달궈진 유리로 가지각색의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이들은 “예술가에게 우호적인 도시 분위기와 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때문에 화이트호스로 왔다”고 말했다.

루멜 스튜디오는 캘거리에서 온 젊은 유리 공예가들의 작업실이다. 최승표 기자

가마에서 구운 유리로 작품을 만들고 있는 젊은 예술가의 모습. 최승표 기자
미술 만이 아니었다. 근사한 공연도 있었다. 싸고 맛난 커피를 파는 ‘베이키드 카페’에서 무료 공연을 한다길래 찾아갔다. 공연 시작 전, 관계자가 “주민이나 오는 소박한 행사인데 아시아 여행자가 와줘서 정말 고맙다”며 인사를 건넸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밤, 지역 음악인들이 피아노·바이올린·어쿠스틱 기타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올드 재즈부터 샹송, 익숙한 캐럴까지. 관객들은 나지막이 노래를 따라 하거나 가볍게 몸을 흔들었다. 더러는 와인을 마시며 눈 감고 지긋이 노래에 취했다. 차가운 북위 60도 도시에서 보낸 가장 따뜻한 밤이었다.

성탄절을 앞두고 베이키드 카페에서 열린 무료 공연에서 지역 음악인이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모습. 최승표 기자
[출처: 중앙일보] 혹한의 땅, 캐나다 북부 소도시에 예술가 몰리는 까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