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국어 시간에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 "순수문학"은 탈정치적인 "이념"을 표방했었는데, 이 순수문학을 한 사람들 중에 친일분자들이었거나 반공이념을 먹고 사는 기생충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좀 커서 알았습니다. 가령, 모윤숙은 친일과 반공의 경계를 넘나든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완독을 했던 그의 [렌의 애가]는 "순수한" 반공이념을 전파한 책이죠.
「시몬, 그대는 들리는가 낙엽밟은 소리를 나는 그대와 함께 낙엽이 떨어진 산길을 걷고 싶소 시몬, 낙엽이 하나, 둘 떨어지는 오솔길에서 낙조를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이던 그 곳을 다시 걷고 싶소 시몬, 그대가 떠난 어딘가는 나는 그대의 발자취를 따라 먼길을 가고 싶소 」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정치나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윤숙은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의 정책을 순수하게 내면화시켰고, 박정희 때는 반공정책을 수순하게 내면화시킨 인물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개인도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런 개인은 기존하는, 즉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개인화해서 (personalize the political situation) 나름 실천하는 삶을 삽니다. 평소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요.
캐나다 연방선거 사전 투표가 끝났고 곧 9월 20일은 공식적인 선거일입니다. 다음의 링크는 각 당이 지향하는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니 참조하십시오.
How do the main parties compare on these issues?
현재 캐나다의 주요 전국당은 6개입니다.
자유당, 보수토리당, 신민당, 퀘벡부족당, 녹색당, 인민당
현재 설문조사에서 위의 정당 중 토리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자유당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유당은 다수당 되려고 괜히 조기선거 하려다가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정권이 바뀌면 우리 인민의 삶도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참고로, 인민당은 보수당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신생정당입니다. 정당은 개인의 "순수" 이념이 제도화된 형태인데, 어떤 정당을 선택하느냐에 그리고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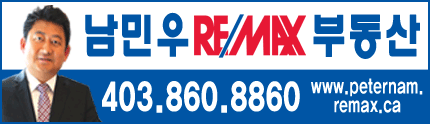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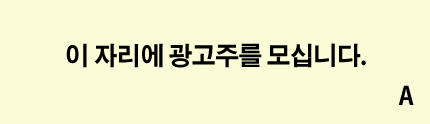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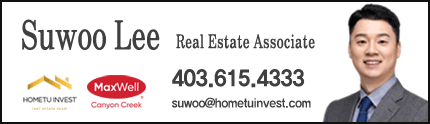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올리신 글과 정보 잘 읽었습니다.
여성이신 모윤숙 시인에 대해 좀 많이 강조하신 것 같아, 여성으로서 좀 무안해서 아래 링크를 올립니다.
* 친일 문학인 42인 명단
https://ko.wikipedia.org/wiki/%EC%B9%9C%EC%9D%BC_%EB%AC%B8%ED%95%99%EC%9D%B8_42%EC%9D%B8_%EB%AA%85%EB%8B%A8
시 분야:
김동환 (23편)
김상용 (3편)
김안서 (6편)
김종한 (22편)
김해강 (3편)
노천명 (14편)
모윤숙 (12편)
서정주 (10편)
이찬 (8편)
임학수 (8편)
주요한 (43편)
최남선 (7편)
친일파 순수 한국 문학인들은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반공주의 순수 한국 문학인들은 좀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순수함과 현실적인 선택은 정신(영혼)과 몸(육신)이 하나인 것과 같은 원리 또는 결합체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제가 지나가듯 쓴 친일/반공주의는 여성이나 남성의 문제라기 보다는 문화나 정치체계 안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작동이나 행동을 하는 것에 주목한 것 뿐입니다. 남녀노소인종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 놓은 틀을 향유하거나 이용해서 생존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저는 문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런데 관심은 좀 있죠. 오래 전 한국 갔을 때, 사 온 [반공주의와 한국문학] (2005)이라는 책에서는 한국문학에서 순수의 이름으로 반공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순수의 문제를 인문사회과학적 개념으로 정리한 사람으론 제가 알기론 영국의 사회인류학자 Mary Douglas입니다. 그/녀의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1966)가 바로 그 고전이죠. 한글로는 [순수와 위험]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은 인류학적 책이지만 구약성서(히브리) 성서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순수”의 개념을 정치/사회의 영역에서 논한 것은 Barrington Moore, Jr.의 [Moral Purity and Persecution in History] (2000)은 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친일파는 전통적인 한국민족이나 사회보다는 일본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만들어놓은 체계를 향유한 사람들이고 여기에 목숨을 걸기도 하죠. 속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박정희가 그런 순수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반공주의를 향유한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불순한 사람들이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위에 제가 링크 단 정당비교 중에서 극우에 속하는 People’s Party가 인종불평등(Racial inequality) 이슈에 대한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People’s Party has no specific measures on racial inequality. It has criticized Canada’s approach to multiculturalism, arguing that it is based on an idea that Canada has “no distinct ... identity.” The party would repeal the Multiculturalism Act, end funding to promote multiculturalism and focus on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인민당은 다문화를 배격합니다. 그들지 지향하는 “people”이라는 범주에 다른인종이나 다른문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의 “인민”들은 매우 협소하지만 나름 순수한 인민을 보전하려는 것이죠. 그들이 지향하는 “분명한 정체성” (distinct identity)이 뭔지 흥미롭죠. 자기들의 순수함을 유지하려는 욕망은 좌파나 우파에서 모두 나타납니다. 무식한 대중을 계몽하겠다고 발벗고 나서는 것도 바로 순수를 향한 욕망 때문입니다. 과거 쏘련 공산당이 시베리아의 무당들을 잡아다가 죽이거나 캐나다 정치계와 기독교계가 야만인 또는 비문명적인 원주민 아이들을 잡아 자기들의 원하는 순수한 문명인으로 만들겠다고 residential schools에 처넣어, 그들을 차별, 학대, 남용을 한 것도 이런 것에 속하죠. 순수라는 개념은 타자를 원시화, 악마화, 불순 등으로 만들어 지신들의 문명적, 인종적, 지적 우월성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빠진 것이 바로 타자의 경험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 즉 empathy가 없다고 봐야죠.
결론적으로 “순수” (purity)라는 것은 사회, 정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장치 (heuristic device)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순수(purity)의 정의를 제 종교와 과학 분야에만 제한해 왔습니다.
제 종교에서의 순수(다른 종교에서는 모릅니다): pure in heart - 영적으로
과학에서의 순수: 다른 물질과 섞이지 않은 단순 물질
그외의 다른 분야에서와 특히, 정치와 인종에서의 순수는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 이유, 동기, 목적 등등의 꿍꿍이 속들이 있어서 부르짖는 말일테니까요. 제 주위에 이 인민당에 속한
사람이 한 분 있는데, 저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다양성(diversity)이려니 하고, 좋게 해석하고 제 자신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헌데, 이분이 이민 온지 얼마 안되시는 이민자이시니, 참 신기합니다..
하여튼 이번 총선은 불필요한 총선에요. 소수당이니 4년 채우기는 어차피 어렵기는 하지만.
캐나다 이민 2-3세대로 넘어가면 다문화적 인식이 몸에 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문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갖는 잘못된 믿음은 이민자들이 자기들이 갖고 온 문화만 고집하지 기존 문화를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반이슬람 정서(Islamophobia or Muslim scare)입니다. 이슬람은 기존 사회에 동화는 커녕 교류가 전혀 없다는 불신이죠.
배움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회가 발전해 온 것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살륙을 자행하는 대신 서로 교류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도와가려는 노력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다문화론(multiculturalism)의 강점은 영원히 고정된 듯하는 순수와 비순수의 이항대립쌍으론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입니다. 나와 다른 문화가 더디간다고 배척하거나 척결하는 대신 두고 기다리는 기다림이라는 인내를 갖고 그리고 다문화를 향한 노력을 놓지 안는다면 캐나다가 다문화다운 사회로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신 오래 이 땅에서 산 원주민들의 territories 를 우리가 존중하며 기억하고자 노력하는 작금의 좋은 모습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