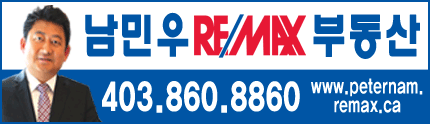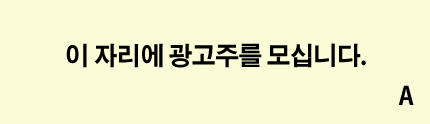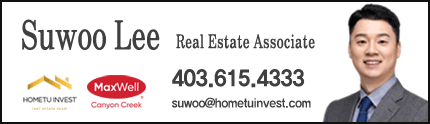주의 1) 소설 ‘Never let me go’ by Kazuo Ishiguro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주의 2) 개신교 신자에게 적합한 글이 아닙니다.
+++
매일 수많은 광고 이메일을 받는다. 대부분은 읽지도 않고 휴지통으로 직행하지만 아마존의 책광고만큼은 꼼꼼히 살펴본다. 광고에 혹해서 원클릭으로 사버린 책들이 쌓여만 간다. 언제 다 읽지?
그런 책 중에 최근에 읽은게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일본계 영국인 소설가 Kazuo Ishiguro의 Never let me go 다. 그리고 나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 혼자만 가슴에 담고 있기엔 우울감이 계속 깊어져서 결국 아내에게 소설 이야기를 꺼냈다. 대충 줄거리를 말해 주니 아내의 첫 반응은 이랬다.
“아니, 왜 안 도망가?”
글쎄, 왜 도망가지 않을까? 나는 인간에게 사육되는 소들의 입장에서 왜 도망가지 않는지 추측했다. 그리고 아내는 납득했다. 결국 헤일셤 기숙 학원은 유기농 소를 기르는 목장이었을 뿐이다. 유기농 소이던 일반 소던, 인간으로부터 탈주하는 것은 유전자 레벨에서 이미 불가능해졌다.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윽고 우울감에서 탈출했다. 하마터면 채식주의자가 될 뻔했다.
인간도 사실 거대 시스템 속에 갇혀 자신의 불운한 처지를,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면서 감수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나도 어릴 때 내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 땅에 태어났다” 라는 걸 믿었다. 국민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린 국민교육헌장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따라다녔으니 배움에 충실했던 성실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믿었을 것이다. 사실 이걸 외우지 못하면 선생이 두들겨 팼다. 폭력으로부터 각인되어 아직도 그 쓰레기를 기억하고 있다는게 치욕스럽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도그마로부터 도망쳐 캐나다에 살고 있다. 그 땅과 그 민족을 떠나서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얻기만을 목 놓아 기다린다. 결국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 이라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도망쳤다. 홀가분하다.
소설로 다시 돌아와서, 헤일셤 출신을 비롯한 그들은 사실 창조주의 느슨한 보호 속에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한정된 범위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고 있다. 그리고 창조주가 그들을 창조한 목적에 맞게 쓰여질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다. 기독교 관점에서는 어쩌면 그들에게 행복한 결말일 수도 있다. 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어릴 때 교회로부터 도망친 기억 때문이다.
친구들이나 주변 어른들의 손길에 이끌려 교회를 몇 번 끌려다닌 적이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사를 결국 받지 못했다. 신과 인간의 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전지전능하고 인간은 너무나도 보잘 것 없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한 존재일 뿐이다.
칼뱅의 이중 예정론에 이르면 더더욱 정신이 혼미해진다. 인간 따위가 감히 하나님의 의중을 바꿀 수 없다. 즉 어떤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신을 찬미한다 해도 그의 구원은 보장되지 않는다. 이미 모든게 신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 하찮은 인간 따위가 절대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움직여 자신의 운명을 바꿀 여지는 전혀 없다. 그런 시도 자체가 시건방진 일이다. 그래서 내가 이 쓰레기같은 똥글을 쓰는 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이미 예정한 일이다. 무력감이 몰려온다.
교회로부터 도망치자 세상을 보는 다른 시각들이 다가왔다. 신과 인간이 엄격히 분리된 이원론의 관점을 떠나, 모두가 결국은 똑같다는 일원론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도 있다. 힌두교에서는 범아일여(梵我一如) 사상이 있고, 이에 영향받은 불교에서는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즉, 신과 인간의 관계가 기독교처럼 주종관계가 아니다.
또한 기독교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명확하게 그리고 있다. 그 세계는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그런데 부처는 독화살의 비유를 통해 죽음 이후보다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고 가르친다. 유학의 시조 공자 또한 “현생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사후를 논하겠는가” 라고 했다. 마음에 든다. 교회로부터 도망쳐 무력감을 몰아내고 편안해졌다. 구원을 미끼로 끊임없는 찬양과 복종을 강요하는 창조주로부터 벗어나 독립했다. 야훼의 천하디 천한 노예 신분에서 도망쳐 자유인으로 우뚝 섰다.
기독교 쪽 시선에서 보면 파격적이기 그지없는 이런 관점들은 살불살조, 즉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에서 정점을 이룬다. 불교의 교조적인 가르침만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스스로 성찰하고 깨우치라는 의미다. 하지만 부처는 천수를 누리다가 식중독으로 입적했고, 오히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아이러니하다.
어릴 때 동네 어른의 손아귀에 이끌려 반강제적으로 교회에 다닐 때 벽면에 걸려 있던 그림이 생각난다. 어진 모습의 예수가 어린 양을 안고 있었고 그 밑에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문구가 있었다. 헤일셤 아이들은 마치 예수가 돌보는 어린 양들같다. 아이들은 조만간 자신들의 가죽이 벗겨져 핸드백이 되고 살점은 양꼬치가 될 운명임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들에게 외치고 싶다. “야, 도망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