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선서할 때 써야 된다 벗어야된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벗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당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게 많지만 이념을 떠나서 종교관습도 세속법에 따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야합을 한다거나 세속법이 종교보다 우위에 서서 종교탄압을 해서도 안되고 종교관습을 존중해 주어야 하지만 세속법에 따라야할 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사회가 모자이크 사회다 보니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데 예를 든다면 무슬림 가족들이 학교에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지키지 않으니 크리스마스 장식을 치워달란다거나 부인, 누이 죽여놓고 명예살인이니 캐나다 형법 말고 이슬람 종교법으로 처리해 달라는건 복합문화를 악용하는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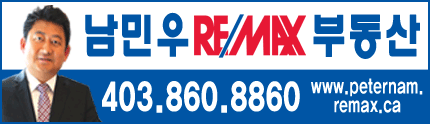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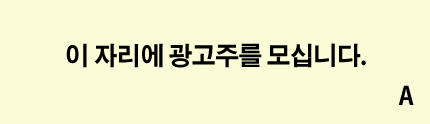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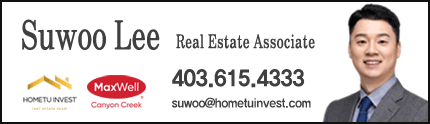

다문화든, 단일문화든 모두 한계가 있다고 보구요. 단일문화는 인종주의 문제가 다문화는 다문화의 한계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항상 문제인데, 매길대의 철학자 챨스 테일러는 인권과 정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그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동등한 인정"(equal recognition)을 통해서 인간이 된다고 합니다.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다문화 이슈에서 우선 무슬림들에 대한 편견의 정도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그의 강연에 참석하였는데 이 분은 신사 중의 신사같았고, 그 해박함에 놀랐습니다.
지난 주 지인이 다운타운 캐나다 플레이스 갔었는데 security들도 아주 고압적이고 불친절해지고 뭘 물어봐도 죄인 취급하더라면서 "기자가 그런 걸 좀 취재해서 쓰라"고 하는데 인구가 많이지면서 생기는 현상인지 캐나다에도 관존민비 현상이 생기는건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요.
몇달 전에 national post인지 globe & mail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인구가 작은 캐나다도 22세기에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장비색깔 전망을 내놓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자원이 많고, 특히 물이 많은 것도 요건이 될 수 있고, 투명한 정치와 민주적 실천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 중에서도 저의 관심을 끈 것은 캐나다가 다문화사회라는 겁니다. 세계의 어느 제국치고 다문화적이지 않은 국가가 없습니다. 로마가 그랬고, 중국이 그랬습니다. 점점 폐쇄적으로 되어가는 캐나다가 아쉽습니다. 난민들 의료보험 적용해 주지 말자는 이야기부터 나온 것이 바로 하퍼 정부에서 시작한 겁니다.
http://www.aljazeera.com/indepth/opinion/2013/09/2013915111722311111.html
캐나다가 다문화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국가라는 것이죠.
저는 히잡, 버카, 니캅 이슈는 테일러가 제시한 "동등인정"이라는 개념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슈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나라가 프랑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가장 세속적인 국가 중의 하나라고 여겨지지만, 프랑스를 포함해서 어쩌면 유럽의 나라 대다수는 다문화적이라기 보다는 기독교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세속화된 기독교세계"(Christendom)를 유지하려는 듯한 느낌이구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이슬람뿐 아니라 다른 기독교종파 그리고 신종교 집단들에게 대해서 가장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구요. 미국과 캐나다는 기독교가 주류이긴 하지만 다문화적 인식은 더 강하다는 느낌이 들구요. 세속적인 퀘벡은 파랑스를 많이 닮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캐나다는 현재로선 가장 모범적인 다문화 국가라고 저는 보구요.
검색해 보니, 이런 글도 있군요.
"공진수 기자 답변 2-목사님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물었지요. 독일의 경우 목사님들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종교 공무원이라고 할까요? 따라서 국가는 목사님에 대한 대우를 공무원에 준해서 하고 있지요. 아울러 종교청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에 내는 세금 중의 아주 적은 분량들이 모여서 종교청으로 보내지게 되어 있답니다."
출전: 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id=1397
"국교나 왕실 종교로 지정된 경우, 유럽에서 개신교를 국교 또는 왕실종교로 정한 국가는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덴마크, 스위스 일부지역, 잉글랜드 등지이며, 국교는 아니나 종교세금으로 국가와 연계된 국가로 독일이 있다. 이 국가들의 국교회 소속 목사의 신분은 준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된다. 따라서 이 국가들의 목사는 교회법에 따라 석사 학력인 신학교를 졸업하고 국교회에서 정한 과목과 연수과정을 마치고 목사로서 자격 즉 안수를 받게 된다."
출전: https://ko.wikipedia.org/wiki/%EB%AA%A9%EC%82%AC
저는 토마님께 답글 찾다가 단 한마디 말, 즉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기독교가 국가종교라는 사실에 처음으로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종교적 지형을 감지하지 못하고 막연히 복지국가가 잘된 나라는 복지체제가 종교를 대체할 것이라는 이론을 수용했었는데 다시 더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런 국가 종교가 해체된 다음의 자유경쟁체제에 돌입한 종교시장이 형성되면 어떻게 유럽의 종교지형이 바뀔까 하는것이죠.
로드니 스탁과 로저 핑크에 의하면, "게으른 성직자와 게으른 평신도들의 구조"를 갖고 있는 종교는 쇠퇴한다고 했는데 유럽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세금으로 돈도 대는데 목숨걸고 선교 열심히 할 필요 없죠. 그래서 교회형과 종파형은 돌고 도는 겁니다. 캐나다에서 연합교회는 지고, 얼라이언스 교회는 성장하고, 미국에서 장로교회, 감리교회, 에피스포칼 교회는 지고 침례교나 무교파 소속 성서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목숨걸고 전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죠. 토마님 말씀대로, 독일에서 종교세가 종국적으로 취소되면 기존 교회는 더 치명적으로 죽고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신종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파적 집단이 유럽에서 상당히 선전한다는 글을 10년 전 읽었는데 요즘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제 추측은 이들나라들은 적어도 한동안은 무신론자또는 종교냉담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거역하기는 어려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나라에서 실질종교인 (교회에 가고 기도를 하는) 은 이슬람이 1등을 할날이 멀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편이구요.
캐나다에서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적인 옷차림에 대해 입어라 벗어라 명령하기 전에 그들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람 여성들의 베일은 고대의 코란에 기록된 것을 문자적으로 읽고 지키는 종교적 전통이기도 하고, 사막지대의 기후 때문이기도 하고, 계급사회의 부산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어느 웹사이트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이슬람 전통을 간략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히잡, 차도르, 부르카, 아바야, 니캅 - 이슬람 여자들의 의복 차이 (출처www.kiss7.kr)]
"사실 히잡, 차도르,부르카, 니잡 등은 비잔틴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상류층 여성들이 착용하던 권위의 복장이었습니다. 17세기까지만 해도 상류층 여성들은 하류층 여성들과 신분을 구분시키기 위한 과시용으로 히잡, 차도르, 부르카 등을 입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히잡, 차도르 등은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복장이 아니라 남성들도 다른 형태일 뿐 역시 착용하는 복장이기도 합니다.
이슬람의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막이며 뜨거운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중동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필요에 의해 입게 된 복장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히잡과 차도르가 겸손과 신앙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남성들에게도 이런 복장이 권장되는 것도 역시 종교적 영향이 크며 여성들에게도 종교적인 신앙의 겸손과 사회풍습적인 신체노출 금지를 상징하는 의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전 세계가 이슬람의 히잡, 차도르, 니잡 등이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의복들은 계속 권장과 금지를 격어 왔던 시대의 의복이기도 합니다. 중동지역의 히잡 등의 베일은 18세기가 되자 급격히 전파됩니다. 코란의 원리를 내세우는 보수적 이슬람파가 여성들은 얼굴 뿐 아니라 전신을 가려야 한다고 설파하였습니다. 부르카 같은 전신용 베일도 이러한 영향을 받은 의복입니다.
입으라면 벗고 벗으라면 입으려는 아바야, 부르카, 히잡, 니캅:
그런데, 19세기 이후 서양의 문화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슬람 내부에서도 변화가 시도되었습니다.
알제리의 경우 알제리를 점령한 프랑스군은 전통의상을 입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전통적 자부심을 잃지 않으려는 알제리 여성들은 오히려 차도르 입기를 고집하기도 하였습니다.
터키의 경우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를 고치려고 유럽식 복장을 강요했지만 오히려 여성들은 검은색 차도르를 당당하게 입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한때 서구식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팔레비 정권을 무너트리고 집권한 이란의 호메이니 정부는 강제적으로 히잡을 걸치도록 법까지 만들었는데, 이번엔 여성들이 히잡을 입지 않겠다고 항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은 부르카를 강제로 착용하게 했었는데, 여성운동가들은 여권신장의 상징으로 부르카를 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쿠웨이트는 아바야를 거부하는 사회였지만 외세의 침략을 받은 후 여성들은 오히려 아바야 입기를 시도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입으라면 벗겠다고 하고 벗으라면 입겠다고 하는 역사를 가진 의복입니다. 히잡, 부르카, 차도르 등은 이슬람 여성들에게는 저항의 상징이기도 하며 동시에 자존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세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동 여성들은 억압이라고도 하고 문화라고도 하며 논란의 히잡을 계속 착용하는 것입니다.
차도르, 아바야, 히잡, 니캅, 부르카의 차이 :
외국인이 보기에 히잡인지 차도르인지는 잘 구별도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눈에는 그저 얼굴과 몸을 덮은 답답한 의복일 따름입니다. 하지만 히잡, 니잡, 아바야, 부르카, 차도르는 그 나름대로의 모양과 차이가 있습니다. ‘히잡’은 머리에 써서 가슴까지 가리는 천인데 대체로 얼굴은 보이는 머리쓰개입니다. ‘아바야’는 얼굴, 손발을 제외한 온몸을 가리는 넉넉한 천인데 특히 외출용으로 많이 입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조선시대의 장옷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의복입니다. ‘차도르’라는 옷도 있는데, 아바야와 거의 비슷하며 이란 등지에서 특히 차도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니캅’은 눈은 보이지만 몸 전체를 가립니다. 특히 모로코, 파키스탄 등에서 더 많이 보입니다. ‘부르카’의 경우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체를 망토로 가립니다. 온 몸을 가리는 것이 목적인 부르카는 눈 부분마저도 망사로 덮어서 완전히 신체가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카프 같은 ‘아미라’와 ‘샤일라,’ 상반신만 가리는 망토인 ‘키마르’ 등도 있는데 그들 나름으로는 이런저런 차이가 있는 의복들입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나마 개방적인 지역에서는 히잡, 차도르 등을 입고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니잡, 부르카 등을 입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항과 관습이 교차되는 히잡, 아바야, 차도르 :
아바야는 조금 더 멋을 내는 형태의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이슬람 여성 복장처럼 아바야도 검은색이 대부분이지만, 수를 놓거나 디자인을 바꾸거나 장식을 하거나 해서 아랍 여인들이 외출을 할 때 주로 입는 옷입니다. 외국인이 관광을 오게 되면 이 옷을 입어야 거리를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여성이 맨몸으로 그냥 다니면 손가락질과 일종의 테러를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단, 국가 대표자격으로 방문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중동 이슬람 국가들의 규칙은 있습니다.
엄격한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이 강제적으로 히잡이나 차도르, 부르카, 아바야, 니잡 등을 입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흔히 알듯이 무조건 배척해야 여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의복은 아닙니다. 위에서 열거했듯이 시대에 따라, 또는 동시대이더라도 가치관에 따라 착용을 하게 하면 안 하려고 저항을 하고 착용 못하게 하면 입으려고 저항을 하는 옷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차도르, 아바야, 히잡, 부르카 등등의 이슬람 의복들... 이슬람 여성들이 스스로 착용을 결정하기 전에 외국의 외부인들이 먼저 비난하고 참견할만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Veiling의 이슈에서 늘봄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고, 퍼 오신 글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북미에서 무슬림 여성이 베일링을 하는 것은 억압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 여성임을 당당히 표현하는 어쩌면 페미니즘적 요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베일링을 여성억압의 상징으로 보면 바로 정리가 되는데, 이민 전에는 베일링을 하지 않았다가 캐나다로 이민 온 후에 베일링을 시작한 여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라에서 주는 연구비로 연구하면서 상반된 얘기하는거에 대해서, 그 위베라는 자가 왜 힐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연구비는 모 그런거 하라고 대주는건데요. 김일성대학도 아니구요 ㅎ
Donald Wiebe는 훌륭한 학자이니 나쁜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론적으로 아직은 reliable하지 않다고 본 것 같구요. 제가 위베를 잘 못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위의 두 사람이 같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흥미롭잖아요. 두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우리 같은 범부들이 덜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들은 에피소드론 위베는 솔직한 사람이라고 보구요. 수십년전 어느 기독교학교에 잡 인터뷰 했을 때, 신을 믿느냐는 질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해서 짤렸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토론토대에 있구요. 종교이론에 대한 글도 많이 쓰고 편집도 많이 한 분이죠.
Donald Wiebe, "Milestone or millstone? Does Norenzayan’s book live up to the hype?," Religion (2014): 674-683.
참조하시구요.
"I am dumbfounded that Norenzayan’s colleague at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Edward Slingerland, has recently provided an alternative account of human 'ultrasociality’ without reference to any gods, big or small. It is especially surprising given that Norenzayan and Slingerland are jointly engaged in a well-funded major research project on religious prosociality. I draw attention to Slingerland’s thesis not because I find it convincing; indeed, as with Norenzayan’s hypothesis, I find it unsupported by the evidence. My comments on Slingerland, therefore, are intended rather to suggest that the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would be better served if there were further critical scrutiny of our theories within the academy before taking our individual imaginative proposals directly into the
public realm."
그러니까 돈도 같이 많이 받았으니 서로의 가설을 보완하던지 아니면 비판하던지 해야겠죠. 제가 이 부분만 뚝 잘라내서 그렇지 위브의 글은 나름대로 균형집힌 것 같구요. 노렌자얀의 책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비평은 비평이니 그들이 무시하거나 참조하면 되겠죠. 노렌자얀은 지나치게 서양종교에 경도되어 있고, 슬린저렌드는 중국종교에 경도되어 있으니까 현상의 일면만 보다보니 각자의 가설이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고 위브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다보니, 베일링이 유럽까지 넘어 가고 따서 큰 신과 무위(wu-wei無爲自然)까지 멀리 와 버렸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글 많이 쓴 휼륭한 학자라고 그런 바보같은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론적으로 맘에 안들면 이론적으로 모라구 모라구 해야 하는것이지요. 똑같은 연구비 받는 두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르다라는 불필요한 얘기를 하면 안되는거죠.
같은 대학에서 joint research를 서로 한 것 같은데 상반된 결론이 나왔으니까요. 저는 위브가 바보같은 소리를 했다는 생각이 안들구요. 어쨌든 흥미롭잖아요. 전에 위비의 글을 결론만 읽었는데 방금 다 끝냈습니다. 위의 두 사람 책은 올 초에 사두고 읽다가 다른 일에 쫓겨 못읽었구요.
저도 욕하나 하죠. 아직 네장 정도 밖에 안읽었지만, 노렌자얀은 신학자 Paul Tillich를 인용하면서 철자를 Tilich로 틀리게 해놓구요. 제 2장 미주 13. Ground of Being: Tilich, 1951이라 해놓고, 참고문헌에선, Tilich, Paul. (1951), Systematic The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라고 이름 철자도 또 틀리고, 미주와 참고문헌의 책이 틀려요. 그리고 틸리히는 존재의 근거라라는 개념을 썼지만, 책이름으로 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주와 참고문헌이 틀려요. page number도 없구요. 물론 책 소개할 때나 전체가 이 개념을 다룬다면 다르겠지만, 이 양반 틸리히 책을 전혀 안본게 확실합니다. 이런 것도 표절이죠. 또 한가지 제 4장 미주 6에 보면, Wright Mills도 Wrigh Mills로 잘 못표기하고 있는데 밀즈가 편집한 막스 베버의 책도 읽고 인용하는지 쪼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웃자고 한 이야깁니다.
어쨌든, 저는 원래 [큰신들]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를 보려고 검색을 해서 위브의 글을 보았구요. 이것은 심포지엄 리뷰니까 다른 학자들의 평가도 동시에 여럿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위브 덕분에 이런 상반된 결론이 조인트 프로젝트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토마님께서 위브의 글을 읽으면 위브에 대한 오히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아마 심포지엄을 정리해서 특집으로 실어서 이런 에피소드도 실은 것 같으니 오해를 푸시면 좋을 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