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간에 몸학연구소의 글들을 자유게시판에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 연구소가 소개하는 자료들이 지금까지 어느 종교단체들로부터 들어보지 못했던 신선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단체가 전개하고 있는 새로운 기독교 운동은 죽어가는 한국기독교교회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패러다임의 신관에 기초한 세계관과 가치관과 윤리는 설득력을 잃고 있으며 쇠퇴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종교들이 생존하려면 신에서 자연과 인간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즉 신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즉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던 옛날 이야기를 버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즉 믿는 신앙에서 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는 신앙이란 믿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초자연주의 믿음입니다. 종교적이라는 것은 제도적인 종교의 회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특정 교리를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는 관계이며, 사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인식의 진화가 진행되면서 초자연주의에서 자연주의로의 미래의 물결이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하는 글은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기독교를 살리려는 노력입니다.
<<<몸학기독교연구소 - 새로운 기독교 운동>>>
| |||||||||||||
“유신론-무신론을 넘어서 <탈신론>으로 나아가자
신은 있다 VS 신은 없다, 그 끝없는 지리한 논쟁
인류 역사 이래로 대표적인 논쟁을 하나 꼽는다면 유신론(有神論)과 무신론(無神論)의 논쟁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양 지성사에서는 오래도록 "신이 있다"는 주장과 "신은 없다"는 주장이 맞서 왔다. 이는 근대 과학의 발흥 이후로는 더욱 두드러졌으며 종교와 과학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빚기도 했었다.
초창기에는 유신론이 거의 다수를 점했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무신론을 주장한다는 건 매우 불온시되고 금기시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성취는 차츰 기존의 유신론 진영을 위협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에는 좀 더 이해가능한 과학적 지식의 확장으로 인해 오히려 무신론 진영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기존 유신론 진영의 폐해에 대한 반발이 작동되는 지점도 한 몫 할 것으로 본다.
"신이 있다"는 생각과 "신은 없다"는 생각은 여전히 전제로서 작동될 뿐, 증명된 완결된 결론이라고는 볼 수 없다. 생각컨대, 신에 대한 존재 증명은 결코 완결되거나 확증할 수 없는 이론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유-무신론 논쟁은 거의 순수 사변에 대한 고찰에 가깝다. 혹자는 이 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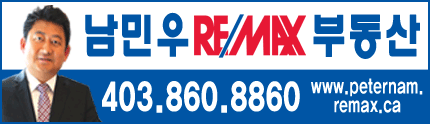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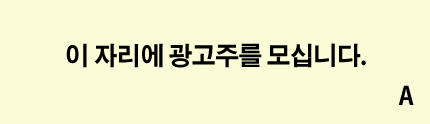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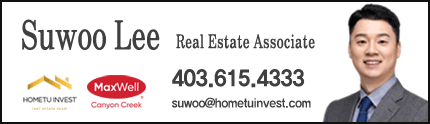

저는 늘봄님의 “깨달음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 늘봄님께서 기독교근본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자주의”를 다른 극단에서 전개하시는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은 여전히 옳다고 보는 편입니다. 어느 사회과학자가 두 형태의 근본주의 형태를 분석했었는데, 순수한 문자주의적 근본주의자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글을 썼었습니다. 근본주의자도 어떤 때는 문자주의적으로 어떤 때는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을 나름대로 하는 해석학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늘봄님께서 어느날 나는 유신론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선언하셨을 때, 늘봄님은 문자주의의 정점에 와 있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이것도 저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구요.
유대-희랍전통에서 유신론과 무신론의 논의는 당연하고 탈신론적 논의도 어제 오늘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신론에 대한 문제는 인도-불고 사상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인도는 인도인구보다 더 많은 신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특정 신에 봉헌하는 유일신적 실천도 있고, 불교의 공사상도 인도에서 출발했고 중국에서 만개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인도에서는 어떠한 초월적 신도 부정하는 “일원론”(monism)의 철학인 “베단타” (Advaita Vedanta) 사상을 전개했습니다. “Advaita”라는 말이 바로 “non-dual”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상들은 여전히 해석의 여지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현재 논의하는 여러 종교적 철학적 세계관의 전범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언어가 생긴 이래로, 인간의 상상의 날개는 끝이 없었고 종교적 철학적 상상력도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위의 퍼오신 글 보면, 별로 새로울 것이 없고, 그냥 metaphorical 또는 poetic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칼 맑스 선생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했을때, 이것은 사회과학적 “이론”(theory)이 아니라 은유적인 것이라고 사회학자 로드니 스탁은 평가했습니다. 은유적인 말은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에 대한 모든 신학적 논의는 바로 이러한 은유적 혁신의 여울에서 낙옆처럼 맴돌다가 홍수가 나면 떠밀려 갑니다.
참 흥미롭게도, 늘봄님은 “깨달음의 하나님”은 은유로 사용하셨지만, 오히려 문자주의에 반발하는 새로운 문자주의적 진술을 하셨습니다. 가령,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였을 때,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인데 늘봄님은 전자로 해석하셨습니다. 진보신학자 치고 삼위일체를 상징으로 안보는 이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신의 개념도 그것이 어떤 정의를 하느냐(working definition), 그리고 이 말이 지시하는 지시대상(referent)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신은 똥이다”라고 했을 때, 신이란 말의 referent는 “똥”이 됩니다.
또 갑자기 무신론 유신론 논쟁을 넘어서서 탈신론으로 가자는데, 그렇다고 그러한 논쟁이 없어지지는 않죠. 그런데 이것은 신학의 영역에서 그렇지 종교학하는 사람들치고 저는 이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늘봄님은 몸학연구소를 소개하셨지만, 제가 일반회원으로 있는 “한국종교문화연구소”같은 곳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이 논쟁에 가세한 분은 없다고 봅니다. 종교현상학자 정진홍 선생 같은 분도 도킨스의 종교 비판을 지나치다고 했지 그의 무신론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신에 대한 믿음의 현상을 잘 이해하거나 신에 대한 거부의 현상을 잘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출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킨스의 무신론 “현상” 외에는 그의 무신론의 논의의 내용의 진위에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The God Delusion]의 제 5장 “The roots of religion”은 괜찮은 장이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이론을 세워 종교의 기원의 문제를 논하고 있으니까요. 그의 종교 이론이 잘된 것인지는 다른 진화론자들이 잘 평가하겠죠. 이와 관련하여, 늘봄님께서 퍼오신 글의 마지막 부분은 “사실상 그동안 많은 무신론자들이 반대해왔던 신은 결국 초자연주의적 신을 말한 것이지, 예컨대 범신론 같은 다른 유형의 신론들에까지 이를 극렬하게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쉽게 말해 리처드 도킨스가 범신론까지 완전 반대를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는 그 자신의 저작 에서 공격의 타겟을 초자연주의적 신에 한정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다.”은 아주 나이브한 평가입니다. 도킨스는 종교의 기원의 문제를 설명한 것이지 주요한 테제죠. 위의 것은 결과로서의 무신론입니다.
무신론도 아니고 유신론도 아니고 탈신론도 물론 가능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무익한 논쟁보다는 철학자 Richard Kearney의 [Anatheism: Returning to God after God]가 더 유익하다고 봅니다. “Anatheism”라는 말은 “재신론”이라는 말입니다. 이 책이 흥미로운 것은 신의 죽음의 논의 이후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적 논의를 포용하자는 것이죠.
저는 아직까지 늘봄님께서 전통적인 신관에 obsessed된 것을 볼 때마다, 늘봄님의 과거 근본주의적 신앙의 연속성을 본다는 판단은 지나친 속단일까요? 늘봄님께서 “오늘날 인간의 인식의 진화가 진행되면서 초자연주의에서 자연주의로의 미래의 물결이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여기에 소개하는 글은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기독교를 살리려는 노력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중국과 소련은 종교를 말살하려는 militant atheism였는데, 사실 두 체제 모두 거의 자본주의 체제로 전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나라에서 공산주의의 무신론은 죽었고, 유신론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해는 비평을 앞서야 합니다. 신학적 실험은 실험으로 족해야 하고, 그러한 실험의 수용은 독자 또는 일반인들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신의 죽음의 신학의 담론이 거의 죽어버리고 유신론이 현재도 여전히 주요한 담론이 된 것은 바로 human needs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포이어바하가 말한 바대로 신학은 결국 인간학입니다. 우리가 초월의 신을 더 이야기 한다고 해서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human needs에 응답한 결과가 바로 유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늘봄 선교사님께서 선교학적 메시지보다는 현지인의 언어를 먼저 배우고 현지인의 문화와 종교를 먼저 배우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Korean Sketches]를 쓴 캐나다인 James Gale은 한국의 선교사였지만, 한국어와 한국종교를 연구한 소박한 언어학자이자 종교학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선전(propaganda)의 동기와 선교적 열정(missionary zeal)을 동시에 가지는 경향이 있죠. 선교사가 되는데 보상은 꽤 클 수 있습니다. 도킨스 선교사님도 종교이론보다는 무신론 선교사가 되면서 돈도 꽤 많이 벌었다는 뒷소문도 있더군요. 도킨스 선교사님이 무신론 선교 대신에 종교이론의 이론가로 나섰다면 학계에만 알려졌을텐데요. 선교사도 되고 이론가도 되고, 돈도 벌고 참 흥미로운 세상입니다. 아프리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