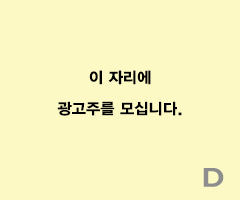영주고을
길은 구불구불 느릿하게 깊이도 들어간다
읍내를 떠난 시간은
그렇게 삼켜지는 듯 하더니
태백자락에 영글은 사과밭에 머문다
한손엔 사과를
등에는 배낭을 멘채 앞에가는
여인의 긴 머리카락이
생각없는 발걸음을 재촉 한다
겨울해는
저리도 기울어가는데
안양루도 무량수전도
배불뚝이 기둥도
천년의 소리없음을 소리친다
비어있는 곳엔
염불도
마당쓰는 행자도 없다
그저 찬바람에 낡은 퐁경 소리만 있다..
스님들은
저...
지는 해모습에
사무치는 아름다움에
부처님 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