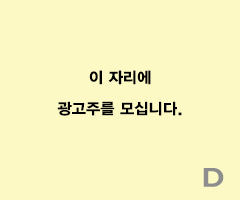|
|
|
|
|
|
|
| 그까짓 눈에 대한 단상 |
|
작성자 자유를 꿈꾸며
지역 Calgary
|
게시물번호 1962 |
작성일 2009-11-28 11:52 |
조회수 1285 |
|
|
|
어제 온 눈은 캘거리에 내린 예전의 적설량에 비하면 그야말로 가냘프게 왔다.
South는 어떨지 몰라도 North에 내린 눈은 좀 쌓였군 하는 정도.
그러나 그동안 포근했던 날싸 탓인지 그까짓 눈에도 캘거리안들은 난리가 났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춥다는 둥,사고가 많이 났다는 둥 둥둥둥...
북소리가 제법 시끄러웠다.
그까짓 눈 때문에....
그까짓 눈은 내가 어릴 때도,젊었을 때도,아이를 키울 때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내렸고 앞으로도 내릴 것이다.
그 정도는 예언(?)할 수 있다.
눈과 어울리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어릴 때에는 얼굴은 하늘을 향하고 입은 벌리고 눈(眼)은 감고 눈(雪)을 받아 먹었다.
바라본다는 얘기다.
젊었을 때는 교통이 막히는것에 대해 무관심할 뿐 아니라 그걸 즐겼다.
So what?
막히는게 뭔데?
시리지도 않은 옆구리를 시리다고 하면서 짝을 찾아 눈을 맞으며 헤맸다.
다행히 짝이 있으면 이젠 시리지도 않은 옆구리에 보온병처럼 달고 다니면서 역시 눈 맞고 다녔다.
가끔 카페를 발견해서 들어가도 꼭 몰래 눈을 뭉쳐 숨기고 들어가선 장난을 치던가 아님 눈탱이를 나눠 먹곤 했다.
여전히 눈과 같이 있다는 얘기다.
지금은?
다들 눈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다.
다들 북소리 요란하게 변죽만 울릴 뿐...
내린 눈은 아무 잘못이 없다.
자연이 인간과 얘기하려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나이를 먹으면서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잊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
교민 신문에 <가을에 부르는 노래>를 연재하면서 얻은 건 내가 자연이 되는 법을 다시 배운거다.
바람이 되는 것.
바람이 안되더라도 그 바람과 얘기하는 거.
눈이 되는 것.
눈이 못되더라도 그 눈과 얘기하는 거.
하늘을 향해 얼굴을 올리면 된다.
잠시 어린 시절을 회상하기만 하면 어려울 것도 없다.
그까짓 눈이 얘기하는 그 소른거림을 오랜만에 들어보지 않겠는가?
이 다음에 눈이 오면....
춥다고?
이런 젠장....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