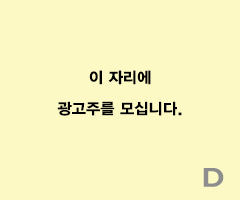|
|
|
|
|
|
|
| 說雪(눈을 달래며) |
|
작성자 자유를 꿈꾸며
지역 Calgary
|
게시물번호 1992 |
작성일 2009-12-05 22:01 |
조회수 1711 |
|
|
|
지난 번 '그까짓 눈에 대한 어쩌구'를 교민 웹사이트에 발표하고 나니 '그까짓'이란 형용사에 맘이 상했는지 눈이란 그까짓게 아니라 이런거야를 제대로 외치고 있다.
누가 캘거리 눈에 대해 몰랐나?
내딴에는 자연과의 소통을 쓰려다가 그런식으로 유혹하는 제목을 붙힌건데 발끈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어제 늦은 시각에 눈보라를 맞으며 도로를 달리며 사방을 둘러보니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니게 눈이 쌓였는지라, garage에 쌓여있을 눈을 걱정하며 집으로 향하는 언덕 도로에 다다르니 여기서부터가 난관이었다.
눈 쌓인 가파른 언덕길을 1단으로 놓고 지그재그로 올라갔으나 집 앞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 쳐박혀 버렸다.
garage 앞에 쌓인 눈이 족히 50Cm는 되어 보였다.
garage로 들어가는 건 엄두도 못내고 후진하여 두 세칸 아래 집 도로에 주차를 시켜놓고 garagae 앞에 쌓인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막내딸이 도와 주었지만 1시간 정도의 사투(?)를 벌인 끝에 겨우 차를 집어 넣을 수 있었다.
다른 집들도 쌓여 있는건 마찬가지였으나 우리 집 눈이 더 많았던 것은 언덕 위에서 부는 바람이 불어오는 정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윗집의 garage는 바람이 싹 쓸어가버려 오히려 깨끗한 것이 좀 얄미웠다.(이 속좁음이여!)
방정맞은 내 손가락이 원인이겨.
'그까짓' 어쩌구 할 때 안 좋은 예감이 느껴지더만....
이럴 때는 소통이구 뭐구 달래는 게 최고여.
눈(雪)을 달래기 위해 하루 종일 눈에 대한 한시(漢詩)를 찾으며 읊기도 하고 옛 선인들의 눈에 대한 감상을 이 기회를 통해 느끼면서 눈을 달래보고자 애썼다.
일종의 눈풀이 또는 눈씻김이라고나 할까?(뭐 그렇게 거창할것 까진 없지만....)
그렇게 뒤적이고 있으니 중국이건 조선이건 이른바 선비들의 봄과 가을 그리고 달(月)과 술(酒)에 관한 시는 넘쳐 나는데 겨울 및 눈에 대한 것은 그것의 반의 반도 안된다.
또한 그래서 얻은 것은 동양은 역시 음력이 어울린다라는 생각.
해보다 달에 대해 이토록 많은 정감을 갖고 있으니 태양력보다는 음력을 더 선호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달를 보며 술을 마셔야 운치가 있는거지 해를 보며 어찌 술을 논하겠는가?
아무튼 거 참 풀기 한 번 힘드네...
그렇게 해서 찾은 시가 아래의 네 한시이다.
캘거리 눈이여!
그대에게 네 수를 바치니 이제 그만 화를 풀고 땅 위에서 점잖게 지내시소서...
山中雪夜 (산중설야) 산 속 눈 내리는 밤에
李齊賢 이제현
紙被生寒佛燈暗 지피생한불등암 얇은 이불에선 한기가 일고 佛燈 어두운데
沙彌一夜不鳴鐘 사미일야불명종 어린 중은 밤새도록 종을 울리지 않는구나
應嗔宿客開門早 응진숙객개문조 자는 客 문을 일찍 연다고 화를 내겠지만
要看庵前雪壓松 요간암전설압송 암자 앞 눈 쌓인 소나무 꼭 보리라
雪 李廷柱(朝鮮) 이정주
曉失雙白鶴 효실쌍백학 새벽에 백학 한 쌍이 보이지 않아
초창望遠空 초창망원공 마음 섭섭하여 먼 하늘을 바라본다
忽聞淸려響 홀문청려향 문득 맑은 학 울음소리 들리니
依舊在庭中 의구재정중 예전과 같이 뜰 안에 있었구나
雪後 (설후) 눈 내린 뒤
李恒福 이항복
雪後山扉晩不開 설후산비만부개 눈내린 뒤 산 사립은 늦도록 닫혀 있고
溪橋日午少人來 계교일오소인래 시내 다리 한낮에도 오가는 사람 적다
구爐伏火騰騰煖 구로복화등등난 화로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뜨거운 기운
茅栗如拳手自외 모률여권수자외 알 굵은 산 밤을 혼자서 구워 먹네.
詠雪 (영설) 눈을 보며
李穡 이색
松山蒼翠暮雲黃 송산창취모운황 송악산 푸르름에 저녁 구름 물들더니
飛雪初來已夕陽 비설초래이석양 눈발 흩날리자 이미 해는 저물었네
入夜不知晴了未 입야부지청료미 밤들면 혹시나 이 눈이 그칠려나
曉來銀海冷搖光 효래은해랭요광 새벽되면 은빛 바다에 차가운 빛 출렁이겠지
<사족>
21세기에 뭔 한시냐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서 서예를 배워서 그런지 영시보다 한시가 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동파를 좋아하지요.
그냥 눈오는 날 한 번 읊어 보는 것도 운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