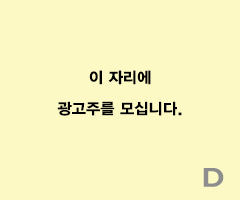내안의물을 가둔지 십년째
책 한줄 안보고 잘 놀았다
날 찾아온 친구는 물었다
그렇게 오래 노느라 지겹지도 않니....
마침 달빛이 뼛속까지 환해서
나는 짐짓 생각난듯
내안의 물꼬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썩은 낙엽과 이끼 낀 때
언뜻, 그 사이로 말라붙은 바닥이 보였다.
"얘야, 어서가자 이곳은 물이 얕아
배 댈곳이 못되는구나"
조주선사가 말하자 동자가 짐을 꾸렸다는
이 바닥이 나의 전부다.
생각하며
친구가 떠나는 모습을 망연히 바라봤다.
검은 상수리나무 사이로
서럽지만 환한 속살같은
새벽 운무 피어오르는 것이다.
|
|||||||||||||||||
|
|||||||||||||||||
| 분별없는 열정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