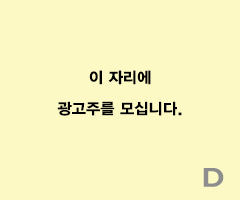지금 나는 팔이 약해져서 코를 풀기 위해 휴지 한 장 들어올리는 것조차 힘겹다. 하지만 아직은 내 아들이 날개를 활짝 펼치고 목초지 위를 맴도는 매를 바라볼 때 그 아이 곁에 앉아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내가 머물러 있고 싶은 세계다.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의 신비 속에서 풍요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병에 걸린 덕분에 나의 행동을 신성한 맥락 안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그래서 어제 했던 일도 오늘은 갑자기 성스러운 행동으로 느껴진다. 수건으로 아이 얼굴을 닦아주는 일도 어제는 다음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치워야 하는 귀찮은 허드렛일, 앞으로 할 일이 열 가지나 쌓여 있는데 공연히 손만 번거롭게 하는 일거리였지만, 이제는 이 아이의 얼굴을 닦아 주는 것, 이 신비로운 의식에 참여하는 것, 그런 식으로 누군가와 내 삶을 나누어 갖는 것이 얼마나 멋진 기회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누구나 풀잎에서, 한 방울의 이슬에서, 아이들 눈동자에서, 또는 꽃잎 한 장에서 신을 보라고 권하는 시나 노래나 기도를 들은 적이 있다. 이제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것은 너무 '쉽다'고 말한다. 우리에게 더 어려운 과제는 고통받는 어린이의 눈동자만이 아니라 고통 자체에서 신을 보는 것이다. 해질녘 레드힐 위에 펼쳐진 진홍빛 노을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라. 하지만 그 구름을 보는 동안 얼굴에서 모기떼를 쫓아야 하는 데 대해서도 하느님께 감사하라. 부러진 뼈와 찢어진 가슴에 대해, 우리의 인간다움의 신비를 알려주는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라... 불완전한 것이야말로 우리의 낙원이다. <토머스 머튼>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 세상과 우리 삶과 우리 자신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질때 비로소 신을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다." 책임을 지는 것(responsible)은 민감한 빈응을 보이는 것(responsive), 응답하는 것(respond)이다. 세 낱말 모두 '약속하다'를 뜻하는 라틴어 'spondeo'에 뿌리를 두고 있다. 're'와 'spond'를 합한 'respond'는 그러므로 처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약속하는 것, 관계를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올 때 맨 먼저 하는 행동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 즉 세상을 이루고 있는 물질을 우리 몸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최초의 날숨과 함께 우리 자신의 일부를 세상에 돌려준다. 우리가 세상을 통과할 때, 세상도 우리를 통과한다. 모든 호흡은 반응이다. 다시 말해서 그 최초의 약속을 갱신更新하는 것이다. 세상을 선택하는 것은 곧 우리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것, 사랑을 그 근원까지 따라가는 것, 시작도 끝도 없는 우리 존재의 그 근저根底에서 편안히 쉬는 것이다. 세상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우리는 모든 용기를 내어 신성한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지방을 넘어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마침내 세계의 신성한 핵심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까지 줄곧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 필립 시먼스의 <소멸의 아름다움>中에서
<저자에 관하여> 죽음 앞에서 삶을 발견하다 ‘루게릭’이라는 불치병을 얻게 된 남자. 그러나 그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면서 오히려 불완전함으로 인한 축복을 깨닫는다. 모든 사소한 것 속에서 신성함을 발견한 것이다. 그 깨달음을 열두 편의 잔잔한 수필로 풀어놓은 것이 <소멸의 아름다움>이다. - 원제: The Blessing of an imperfect Life. Philip Simmons. 2000. 필립 시먼스는 1958년 뉴햄프셔 지방의 산골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미국 일리노이주의 레이크 포레스트대학 영문학 교수로 문예창작을 가르치는 한편 평론과 단편소설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그러던 그가 서른다섯 살 되던 해 루게릭이라 불리는 근위축색경화증에 걸려, 5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된다.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그는 살아가는 기술을 터득하며 되살아난다. 그 기록이 바로 이 책이다. 그렇다고 이 책이 역경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이야기는 아니다. 또한 거창한 인생론을 펼치고 있지도 않다. 어떻게 보면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상사에 대한 관찰과 사색의 흔적들을 담아내고 있다. 죽음 앞에서 삶을, 일상에서 신성을, 초조함 속에서 여유를, 몸의 불편함 속에서 낙관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다. 독자들은 필립 시먼스가 써내려 간 열두 편의 이야기를 읽다보면, 그가 죽음에 처한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너머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통찰을 갖게 해 준다. 작가는 친절하고 측은한 마음으로 소멸의 아름다움을 기록함으로써 세상을 다녀간 흔적을 남겼다. 2002년 7월 27일, 그는 마침내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 지금껏 不實한 몸 탓만 하며, 그것도 부족해 세상까지 원망하며 지내온 시간들. 그의 책을 읽으니 내가 부끄러워진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부터라도, 내가 마주 할 消滅 앞에서 조금이라도 아름다워지는 일을 배워야겠다. 내가 알아왔던 모든 것에 놀란듯이 다시, 처음을 보태어... - 희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