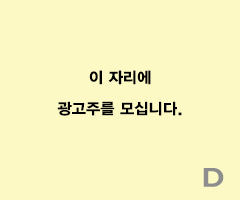처음엔 별로 관심을 안갖다가 한국의 TV 쇼인 [동물농장]을 옆에서 지켜 보곤 합니다. 어떤 땐 "옆의" 님이 재밌다고 이건 꼭 봐야 한다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여 주곤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동물농장을 통해서 동물을 참 많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키우던 고양이 한마리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난후, 가족이 거의 정신적 외상을 입고 있었는데, 동물농장을 보면 더 마음이 아파서, 옆의 "님"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곤 하시죠.
이제 우리집엔 고양이 "지혜" (Sophie;소피아)는 가고 새끼 고양이 "사랑" ( Philo; 필리아)만 남았습니다. Philo+Sophy (지혜를 향한 사랑)이 반쪽이 된 셈이죠. 이것을 한자어로 "哲學"이라 하죠. "철"은 가고 "학"만 남았다고나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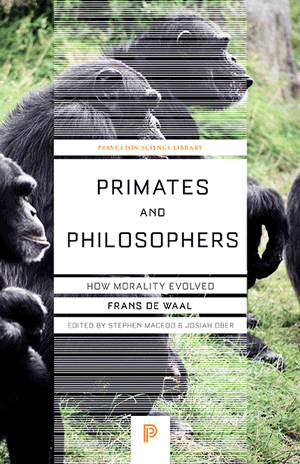
저는 지금껏 동물은 인간과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생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마님으로부터 열린마당에서 소개받은 동물학자 프랜스 드 왈 (Frans de Wall)이라는 사람의 위의 책을 보면서 저의 동물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유인원으로 불려지는 원숭이 (ape)가 유전형질상 90% 이상이 인간과 같다고 하더군요. 동물이 신체상 인간과 같을 뿐 아니라, 다른 동료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감정이입" (empathy) 능력도 있고, 서로 싸우다가 진 동물에게 가서 어깨를 두드려 주는 "마음의 공감" (sympathy)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동료를 위한 살리려고 노력하는 "자비심" (측은지심; compassion)도 있으니 가히 동물이 인간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동물은 특히 apes나 침펜지는 인간과 멀지 않은 형제라고 드 왈은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 동안 동물에 대한 저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상심한 동료에게 등도 도닥거려 주고-나, 너 이해해!>

<오, 자비의 마음>
그러다가 보니, 우리집 고양이 필로를 보면 가끔 헷갈립니다. 진짜 아들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녀석이 잠 잘 때 갸르릉거리면서 애정의 표시로 박치기를 하면 두살난 아들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지하의 서재에서 혼자 책을 보면 음산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사랑 (필로)이가 와서 애교도 부리고 아는 체도 해 주면, 음산한 마음은 커녕 나는 홀로가 아니구나 (I am not alone)라는 생각마저 들죠.
어제 저녁, 한참 지하에서 일에 몰두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필로가 내려 와서는 야옹 야옹, 응애 응애를 부르짖는 겁니다. 눈을 보니 눈물이 좀 고여 있었습니다. 얘가 눈병이 들지 않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타는 냄새가 나는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이 때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 아차, 찌게가 있는 유리 냄비를 불에 올려 놓았었지. 후다닥 뛰어 올라 부엌에 가보니 온통 연기가 자욱하고 2층도 채우고 있었습니다. 유리냄비라 물을 끼얹지 못하고 이것을 들고 화장실로 가져가서는 연기가 빠지라고 팬을 틀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엔 부엌의 팬을 틀고, 1-2층 모든 문과 창문을 다 열어 제꼈습니다.

<저의 집 지하의 책병동>ㅋ 클릭 클릭해서 보시면 온갖 잡동사니 책들이...
필로가 그 때 지하에 내려 온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보다 응애거리는 소리가 더 높아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필로가 연기냄새에 심상찮아서 내려와서 제게 알려 주려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필로가 고마워서 으스러지게 껴안고 뽀뽀도 해주고. 그래, 아들아 고맙다. 네가 아빠를 위기에서 구해주었구나. 아이구, 내새끼, 착한 것!
가끔가다가 재도 저지르고 또 아이 하나 더 키워 일손도 많이 가는데 이 녀석으로부터 느끼는 숨결과 행동 그리고 우는 소리, 옹알거리는 소리 등등 우리 가족에게 전하는 소통을 위한 신호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맘은 함께 오래 지내봐야 알게 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아, 그렇죠. 속성으로 이뤄지는 사랑이란 없다. 시간의 연륜을 지난 다음에야 그림자처럼 오는 것이 사랑이리라.
오래지내다 보면 함게 지내는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 사랑하는 님이 떠나고 난 후의 그 허전함을 어찌하시렵니까? 그래서 함께 있을 때 잘하라는 것이죠. 함께 지내면서 쌓아 온 애증의 탑을 다시 쌓기가 쉬운 줄 아세요? 그렇게 못합니다. 이미 우리 인생에서 써먹은 시간이 많으니까요. 여행을 떠나면서 만나는 새로운 산야와 마을 그리고 유적지도 내마음에 쌓아온 소중한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이웃. 이렇게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죽음을 맞기 위한 사랑의 탑을 쌓습니다.
하이데거가 그랬다나요.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그럴겁니다. 그런데 죽음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사랑의 탑을 많이 쌓아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같아요. 그래도 마지막 숨이 다하는 때, 그 동안 쌓아 놓은 사랑의 탑을 다시 내려놓으면서 마지막 최후의 돌멩이가 남았을 때, 그것을 징검다리 삼아 딛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참 바빠야 될 것같아요. 사랑의 탑을 많이 쌓아야 하니까요. 굳이 우리의 삶이 지혜롭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삶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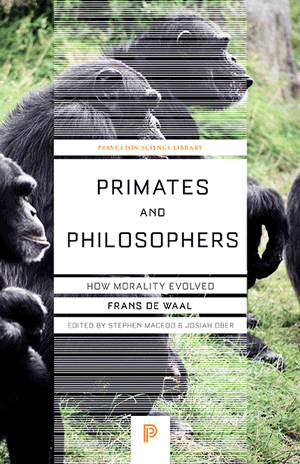 저는 지금껏 동물은 인간과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생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마님으로부터 열린마당에서 소개받은 동물학자 프랜스 드 왈 (Frans de Wall)이라는 사람의 위의 책을 보면서 저의 동물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유인원으로 불려지는 원숭이 (ape)가 유전형질상 90% 이상이 인간과 같다고 하더군요. 동물이 신체상 인간과 같을 뿐 아니라, 다른 동료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감정이입" (empathy) 능력도 있고, 서로 싸우다가 진 동물에게 가서 어깨를 두드려 주는 "마음의 공감" (sympathy)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동료를 위한 살리려고 노력하는 "자비심" (측은지심; compassion)도 있으니 가히 동물이 인간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동물은 특히 apes나 침펜지는 인간과 멀지 않은 형제라고 드 왈은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 동안 동물에 대한 저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껏 동물은 인간과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생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마님으로부터 열린마당에서 소개받은 동물학자 프랜스 드 왈 (Frans de Wall)이라는 사람의 위의 책을 보면서 저의 동물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유인원으로 불려지는 원숭이 (ape)가 유전형질상 90% 이상이 인간과 같다고 하더군요. 동물이 신체상 인간과 같을 뿐 아니라, 다른 동료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감정이입" (empathy) 능력도 있고, 서로 싸우다가 진 동물에게 가서 어깨를 두드려 주는 "마음의 공감" (sympathy)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동료를 위한 살리려고 노력하는 "자비심" (측은지심; compassion)도 있으니 가히 동물이 인간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동물은 특히 apes나 침펜지는 인간과 멀지 않은 형제라고 드 왈은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 동안 동물에 대한 저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상심한 동료에게 등도 도닥거려 주고-나, 너 이해해!>
<상심한 동료에게 등도 도닥거려 주고-나, 너 이해해!>
 <저의 집 지하의 책병동>ㅋ 클릭 클릭해서 보시면 온갖 잡동사니 책들이...
필로가 그 때 지하에 내려 온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보다 응애거리는 소리가 더 높아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필로가 연기냄새에 심상찮아서 내려와서 제게 알려 주려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필로가 고마워서 으스러지게 껴안고 뽀뽀도 해주고. 그래, 아들아 고맙다. 네가 아빠를 위기에서 구해주었구나. 아이구, 내새끼, 착한 것!
가끔가다가 재도 저지르고 또 아이 하나 더 키워 일손도 많이 가는데 이 녀석으로부터 느끼는 숨결과 행동 그리고 우는 소리, 옹알거리는 소리 등등 우리 가족에게 전하는 소통을 위한 신호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맘은 함께 오래 지내봐야 알게 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아, 그렇죠. 속성으로 이뤄지는 사랑이란 없다. 시간의 연륜을 지난 다음에야 그림자처럼 오는 것이 사랑이리라.
오래지내다 보면 함게 지내는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 사랑하는 님이 떠나고 난 후의 그 허전함을 어찌하시렵니까? 그래서 함께 있을 때 잘하라는 것이죠. 함께 지내면서 쌓아 온 애증의 탑을 다시 쌓기가 쉬운 줄 아세요? 그렇게 못합니다. 이미 우리 인생에서 써먹은 시간이 많으니까요. 여행을 떠나면서 만나는 새로운 산야와 마을 그리고 유적지도 내마음에 쌓아온 소중한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이웃. 이렇게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죽음을 맞기 위한 사랑의 탑을 쌓습니다.
하이데거가 그랬다나요.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그럴겁니다. 그런데 죽음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사랑의 탑을 많이 쌓아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같아요. 그래도 마지막 숨이 다하는 때, 그 동안 쌓아 놓은 사랑의 탑을 다시 내려놓으면서 마지막 최후의 돌멩이가 남았을 때, 그것을 징검다리 삼아 딛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참 바빠야 될 것같아요. 사랑의 탑을 많이 쌓아야 하니까요. 굳이 우리의 삶이 지혜롭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삶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집 지하의 책병동>ㅋ 클릭 클릭해서 보시면 온갖 잡동사니 책들이...
필로가 그 때 지하에 내려 온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보다 응애거리는 소리가 더 높아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필로가 연기냄새에 심상찮아서 내려와서 제게 알려 주려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필로가 고마워서 으스러지게 껴안고 뽀뽀도 해주고. 그래, 아들아 고맙다. 네가 아빠를 위기에서 구해주었구나. 아이구, 내새끼, 착한 것!
가끔가다가 재도 저지르고 또 아이 하나 더 키워 일손도 많이 가는데 이 녀석으로부터 느끼는 숨결과 행동 그리고 우는 소리, 옹알거리는 소리 등등 우리 가족에게 전하는 소통을 위한 신호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맘은 함께 오래 지내봐야 알게 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아, 그렇죠. 속성으로 이뤄지는 사랑이란 없다. 시간의 연륜을 지난 다음에야 그림자처럼 오는 것이 사랑이리라.
오래지내다 보면 함게 지내는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 사랑하는 님이 떠나고 난 후의 그 허전함을 어찌하시렵니까? 그래서 함께 있을 때 잘하라는 것이죠. 함께 지내면서 쌓아 온 애증의 탑을 다시 쌓기가 쉬운 줄 아세요? 그렇게 못합니다. 이미 우리 인생에서 써먹은 시간이 많으니까요. 여행을 떠나면서 만나는 새로운 산야와 마을 그리고 유적지도 내마음에 쌓아온 소중한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이웃. 이렇게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죽음을 맞기 위한 사랑의 탑을 쌓습니다.
하이데거가 그랬다나요.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그럴겁니다. 그런데 죽음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사랑의 탑을 많이 쌓아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같아요. 그래도 마지막 숨이 다하는 때, 그 동안 쌓아 놓은 사랑의 탑을 다시 내려놓으면서 마지막 최후의 돌멩이가 남았을 때, 그것을 징검다리 삼아 딛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참 바빠야 될 것같아요. 사랑의 탑을 많이 쌓아야 하니까요. 굳이 우리의 삶이 지혜롭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삶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