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는 펌
-----------------
 공원묘지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조깅을 할 때도 있고 산책할 때도 있고 비석에 새겨진 비문들을 읽기도 합니다. 해질 녘에 가서 어두워 질 때까지 벤치에 앉아있다 오기도 하지요.
공원묘지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조깅을 할 때도 있고 산책할 때도 있고 비석에 새겨진 비문들을 읽기도 합니다. 해질 녘에 가서 어두워 질 때까지 벤치에 앉아있다 오기도 하지요.
 따지고 보면 죽음이란 슬픈 일이 아닌데요. 누구 말마따나 자연의 한 조각......
이 나라에서는 장례식장에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갑니다. 자기 가족 장례식이 아니고 남의 장례식에 갈 때도 그래요. 첨엔 좀 의아했는데 지금은 그게 썩 나쁘지는 않은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죽음과 사물의 유한성>을 수용하는 훈련을 하는 동시에 삶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는 건 유익한 일이지요.
보통 사망 3 일이나 5 일 후에 거행되는 장례식 (funeral service)때 보다는 사망 다음 날 저녁 이루어지는 memorial service 때 많은 조문객들이 오는 것 같아요. 고인에 대한 마지막 작별인사도 이 때 합니다.
갑작스런 죽음이나 긴 혼수상태에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아니고 사망 시기가 대체로 예측되어 있는 경우라면 며칠 전에 친지와 친구들, 그리고 환자가 생전에 꼭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초대됩니다. 그렇다고 단체로 몰려오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개별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저도 제가 아는 분 (신장암으로 사망)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불러주어 생전 작별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죽음이란 슬픈 일이 아닌데요. 누구 말마따나 자연의 한 조각......
이 나라에서는 장례식장에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갑니다. 자기 가족 장례식이 아니고 남의 장례식에 갈 때도 그래요. 첨엔 좀 의아했는데 지금은 그게 썩 나쁘지는 않은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죽음과 사물의 유한성>을 수용하는 훈련을 하는 동시에 삶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는 건 유익한 일이지요.
보통 사망 3 일이나 5 일 후에 거행되는 장례식 (funeral service)때 보다는 사망 다음 날 저녁 이루어지는 memorial service 때 많은 조문객들이 오는 것 같아요. 고인에 대한 마지막 작별인사도 이 때 합니다.
갑작스런 죽음이나 긴 혼수상태에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아니고 사망 시기가 대체로 예측되어 있는 경우라면 며칠 전에 친지와 친구들, 그리고 환자가 생전에 꼭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초대됩니다. 그렇다고 단체로 몰려오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개별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저도 제가 아는 분 (신장암으로 사망)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불러주어 생전 작별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환자의 사망예측시간이 임박하면 병원에서 환자 가족들에게 알려 줍니다.
Time to say good bye...... 가족들과 마지막 기억을 담는 순간입니다.
그 전에 병원에서 hospice로 옮겨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호스피스 병실은 모두 개인병실인데 아주 안락하고 깔끔합니다. 여기서 환자들은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환자를 돌보고 각종 수발을 드는 일은 가족들이 하는 게 아니라 호스피스 직원들이 합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있는데,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나 마치 천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헌신적인 분들이 많아요.
환자가 사망하면 보통 RN (간호사) 가 사망선고를 합니다. 사망선고를 반드시 의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호사는 옆에서 오열하는 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하지요. 이 때 보통 하는 말은 <let him-her-go peacefully,. Good bye, Mr. Sarnia……> 정도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맥을 한참 짚고 있다가 사망선고를 합니다. <아무개 님은 2011 년 9 월 3 일 오후 여덟 시 삼십 이 분 운명하셨습니다> 라고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환자가 사망하자마자 환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간호사의 사망선고가 끝나면 호스피스 직원 (보통은 담당 간병인)이 장미꽃 한 송이를 사망자의 침대 위에 놓아줍니다. 사망자가 머물렀던 층의 로비에는 촛불 두 개가 켜집니다.
이윽고 funeral service 직원들이 도착해서 운구용 카트를 밀고 나가면 호스피스 직원들과 같은 층에 있던 방문객들, 그리고 다른 환자 가족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도열해 줍니다.
장례식을 집전하는 사람들은 보통 clergy (성직자)들인데, 대체로 좋은 말들을 합니다. 보통은 사망자의 삶의 기억과 흔적들 가운데 의미 있는 사건들을 소재 삼아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편 입니다. 따라서 착하게 열심히 산 것과 거리가 먼 사망자들은 <고별사>를 준비하는 장례식 집전자들을 아주 애먹이는 수가 있습니다.
고인이 지금쯤 천국에 가 있을 거라느니, 나중에 요단강 건너서 다시 만날 거라느니 하는,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하는 장례식 집전자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영생>이나 <천국>같은 말들은 인간이 언어능력과 사물에 대한 개념화 능력을 가지면서부터 생겨난 일종의 <파생사고> 잔재들 인데요.
좋은 종교란 이 언어능력과 개념화 능력의 부작용의 일종인 <파생사고>를 치료해 주고 유한성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는 기능을 수행해야지, 거꾸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한 밑천 잡아보려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근데,
sarnia 가 언젠가 죽을 때가 되면…….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가장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혔거나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즉, Say good bye 하기 전에 화해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환자의 사망예측시간이 임박하면 병원에서 환자 가족들에게 알려 줍니다.
Time to say good bye...... 가족들과 마지막 기억을 담는 순간입니다.
그 전에 병원에서 hospice로 옮겨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호스피스 병실은 모두 개인병실인데 아주 안락하고 깔끔합니다. 여기서 환자들은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환자를 돌보고 각종 수발을 드는 일은 가족들이 하는 게 아니라 호스피스 직원들이 합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있는데,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나 마치 천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헌신적인 분들이 많아요.
환자가 사망하면 보통 RN (간호사) 가 사망선고를 합니다. 사망선고를 반드시 의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호사는 옆에서 오열하는 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하지요. 이 때 보통 하는 말은 <let him-her-go peacefully,. Good bye, Mr. Sarnia……> 정도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맥을 한참 짚고 있다가 사망선고를 합니다. <아무개 님은 2011 년 9 월 3 일 오후 여덟 시 삼십 이 분 운명하셨습니다> 라고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환자가 사망하자마자 환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간호사의 사망선고가 끝나면 호스피스 직원 (보통은 담당 간병인)이 장미꽃 한 송이를 사망자의 침대 위에 놓아줍니다. 사망자가 머물렀던 층의 로비에는 촛불 두 개가 켜집니다.
이윽고 funeral service 직원들이 도착해서 운구용 카트를 밀고 나가면 호스피스 직원들과 같은 층에 있던 방문객들, 그리고 다른 환자 가족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도열해 줍니다.
장례식을 집전하는 사람들은 보통 clergy (성직자)들인데, 대체로 좋은 말들을 합니다. 보통은 사망자의 삶의 기억과 흔적들 가운데 의미 있는 사건들을 소재 삼아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편 입니다. 따라서 착하게 열심히 산 것과 거리가 먼 사망자들은 <고별사>를 준비하는 장례식 집전자들을 아주 애먹이는 수가 있습니다.
고인이 지금쯤 천국에 가 있을 거라느니, 나중에 요단강 건너서 다시 만날 거라느니 하는,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하는 장례식 집전자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영생>이나 <천국>같은 말들은 인간이 언어능력과 사물에 대한 개념화 능력을 가지면서부터 생겨난 일종의 <파생사고> 잔재들 인데요.
좋은 종교란 이 언어능력과 개념화 능력의 부작용의 일종인 <파생사고>를 치료해 주고 유한성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는 기능을 수행해야지, 거꾸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한 밑천 잡아보려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근데,
sarnia 가 언젠가 죽을 때가 되면…….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가장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혔거나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즉, Say good bye 하기 전에 화해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그런 건 나중에 차차 생각해 보기로 하고 지금은 일단 배가 고프니까 <웨스트 에드먼튼 몰>로 달려가 오리고기 덮밥을 먹어야겠습니다.
오리고기 덮밥을 먹은 뒤에는, 맥 카페에서 원크림 원슈가 로스티드 커피 뽑아 들고 챕터스 서점에 가서 그 서점 안에 있는 별다방 소파에 죽치고 앉아 코리아 론리 플래닛이나 더 읽어야겠어요.
아무래도 저에겐 죽을 때 걱정보다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여행 준비가 더 급한 것 같거든요. ㅋ
어쨌든
그런 건 나중에 차차 생각해 보기로 하고 지금은 일단 배가 고프니까 <웨스트 에드먼튼 몰>로 달려가 오리고기 덮밥을 먹어야겠습니다.
오리고기 덮밥을 먹은 뒤에는, 맥 카페에서 원크림 원슈가 로스티드 커피 뽑아 들고 챕터스 서점에 가서 그 서점 안에 있는 별다방 소파에 죽치고 앉아 코리아 론리 플래닛이나 더 읽어야겠어요.
아무래도 저에겐 죽을 때 걱정보다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여행 준비가 더 급한 것 같거든요. 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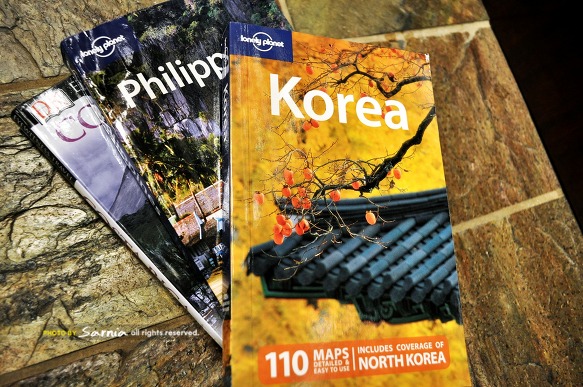





 2011.09.03 23:50 (MST) sarnia (clipboard)
2011.09.03 23:50 (MST) sarnia (clipboard)




![]() 2011.09.03 23:50 (MST) sarnia (clipboard)
2011.09.03 23:50 (MST) sarnia (clip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