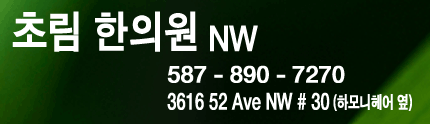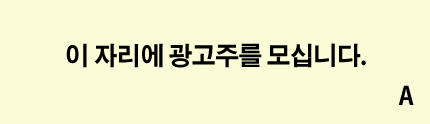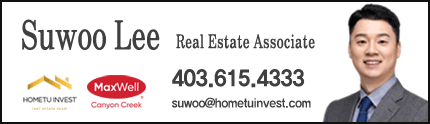이 연주곡을 듣고 도계역을 보면 떠오르시는 게 없나요?
저는 가장 먼저 연이약국이 떠 오릅니다.
Emblem of Unity 를 멋지게 연주해 낸 도계중학교 관악부 똘똘이들과 지휘자 이현우 선생도 떠 오릅니다.
10 년 도 더 오래된 영화 '꽃 피는 봄이오면" 주인공들입니다.
지난 번 사진 올렸던 카사블랑카보다 훨씬 재미있게 본 영화 입니다.
저와 동시대 이야기고 문화코드가 유사하므로 공감디테일이 더 많아서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싸르니아에게는 카사블랑카보다
최민식 나오는 저 영화가 조금 더 명작이었던 셈 입니다.
갑자기 이현우 선생이 한 대사 한 마디가 떠 오릅니다.
"음악은 폼으로 하는게 아니야"
영화는 폼으로 보는 게 아니야
여행은 폼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여행작가가 된 오스트리아 출신 저널니스트 카트린 지타는 자신의 저서 '내가 혼자 여행하는 이유'에서
여행의 묘미가 탈 것의 종류에 의해서도 좌우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을 보다 분위기 있게 해 주는 여행수단으로 기차를 꼽았습니다.
싸르니아는 이 말에 공감했습니다.
기차 중에서도 '느림의 미학'을 느끼기 좋은 비둘기호를 타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한국에서 비둘기호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에서 가장 느리고 대중적인 기차라는 무궁화호를 탔습니다.
그 여행작가 말대로 기차를 탔으니까
국적도 모르는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과 마주 앉아 북적거리며 느림의 미학을 즐길 수 있을까요?
느림의 미학은 어떨지 몰라도 북적거리는 만남은 처음부터 기대에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5대 기간산업을 산업포트폴리오로 모두 보유하고 있는 부자 나라라 그런 걸까요?
무궁화호 같은 저렴한 기차는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싸르니아가 차량 한 칸을 전세낸 것 처럼 혼자 타고 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자동차로 두 시간 반 거리 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 무려 다섯 시간 반이 걸립니다.
두 배 이상 이동시간을 소모하는 셈 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여행을 했으면 건질 수 없었을 옛 영화의 추억을 만났다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저는 도계 라는 강원도의 탄광마을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삼척은 여러 번 가 봤지만 도계는 처음 입니다.
영화 '꽃 피는 봄'이 아니었으면 이름도 생소한 탄광마을 도계를 관심없이 지나쳤을 것 같습니다.
기차안에서 읽을 거리로는 아무래도 가벼운 소설이 좋습니다.
소설이 아닌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는 스무 페이지 쯤 읽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대신 황석영의 장편소설 '해질 무렵'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 거리보다 한층 더 중요한 건 씹을 거리인데, 저 군것질 거리들은 제가 산 게 아니고,
누가 제게 '고국방문을 환영한다'며 선물로 준 과자들 입니다.
오징어 땅콩은 원래 제가 좋아했던 과자입니다.
노란색 봉투에 들어있는 것은 감자칩 이었는데.
느끼하면서 달고 짠 특이한 맛에 말려들어 세 봉지 중에 두 봉지를 탈탈 털어먹었습니다.
내일 하루쯤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혼자
아무데나 훌쩍 떠나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