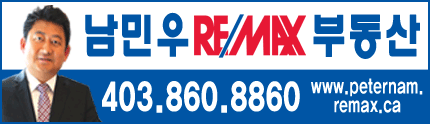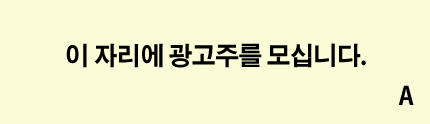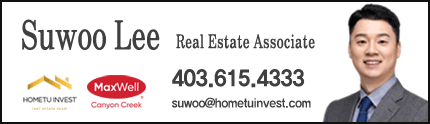늘봄님의 글의 제목과 내용은 “종교문맹” (religious illiteracy)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과학문맹 (scientific illiteracy)이 옳다고 봅니다. 종교맹 또는 종교문맹이란 종교전통이나 종교 일반에 대한 대중들의 무지를 말합니다. 이런 문제를 다룬 책이 제가 아래에 저의 포스트에서 소개한 프로쎄로의 [Religious Literacy]란 책이구요.
프로쎄로가 위의 책을 쓰도록 영감을 준 책은 E. D. Hirsch의 [Cultural Literacy]라고 하는군요. 우리는 살면서 망각하고 사는 것이 참 많죠. 이민생활을 하다보니 한국문화를 접하거나 기억할 기회가 점점 줄어드니까 기억의 연쇄(chain of memory)가 분리/해체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쓰는 기자들의 종교에 대한 무지를 다룬 책은 편집된 책은 [Blind Spot: When Journalists don’t Get Religion] (2009)입니다. 이 책은 기자들이 종교에 대한 무지로 어떻게 사건을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글쓰면 어떻게 될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21세기 중반이 되면 이슬람과 기독교의 세기가 되리라고 퓨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는 한마디로 종교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21세 말에는 무슬림의 수가 기독교인의 수보다 더 많아질 것이리라는 예측입니다. 이슬람은 가장 선명한 유일신론적 종교 (monothestic religion)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독교인의 자녀생산보다 무슬림의 자녀 생산이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신론자의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은 자녀 생산과 연관됩니다. 현재 active 무신론자들도 고령화를 겪고 있는데 반해 얘를 많이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현상” 자체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종교의 이상적 형태가 아니라 종교의 좋은 면과 추한 면을 모두 포함해서 종교라는 현상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이 물리적 현상을 다루듯이, 인문사회과학은 인간과 사회의 현상을 다루는 것입니다. 종교에 대한 이상적 또는 플라톤식 이데아적 형태의 추구는 가능하지만 현상에 대한 이해가 더 앞서야겠죠.
부기 1] 늘봄님처럼 지질학을 공부하셨던 분이 과학적 내용을 쉽게 잘 설명해 주면 일반 대중은 좋죠. 사실 종교와 상관없이 일반대중은 과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 말씀은 과학과 종교는 분명히 다른 체계입니다. 종교는 과학이라기보다는 문학과 상상에 가까운 것입니다. 근본주의자들처럼 신화적 진술이나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거나 이른바 진보적인자들처럼 지나치게 종교를 과학적 진술과의 교집합을 추구하다가 종교현상을 몰이해하거나 환원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케런 암스트롱이 지적했듯이 "mythos" (비과학적 이야기와 감성)과 "logos" (과학적 이성)의 혼돈과 오해에서 온 것입니다. 역사학에서도 뮈토스와 로고스를 구분하려고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