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프로이트와 자끄 라깡의 영향을 맣이 받았다고 합니다. 라깡은 한국에서는 1990년대에 많이 유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꿈이 언어속에 구조화된 무의식을 주장하였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면 라깡에 대한 소개가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시대마다 유행한 사람이 있는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인기있는 사람은 지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래 강연에서 여러분은 유럽의 지성이 한국사회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 강연중에서 지젝이 언급한 The Act of Killing이라는 다큐먼터리는 충격적입니다. 저도 아직 다 못봤는데, 1960년대에 인도네시아에 일어난 대량살육의 주인공이들이 출연하는 다큐인데 아무도 죄의식을 갖기는커녕 마치 사람죽인 것을 영웅담처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외상들이 일제의 식민지를 정당화하거나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하면서 발언하면서 사임하는 모습이나 한국의 정치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조직을 위해서 발언하는 것, 즉 김무성의 의원들의 짜라시 출처등은 바로 지젝이 이 다큐를 지적하면서 분석하는 한국 사회의 자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젝은 스노든같은 내부 고발자들이 많이 나와야 세상이 변한다고 강조합니다. 권과장은 내부고발자도 아니고 진실을 증언한 댓가를 지금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모난돌에 정맞는 것이아니라 모난사회가 착한 개인들을 살해하는 사회는 가히 전체주의 사회라 할 수 있겟죠.
강연참여자들이 참 진지하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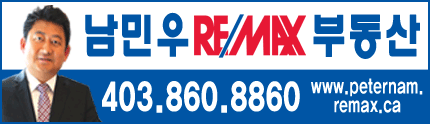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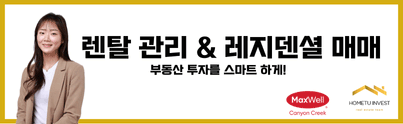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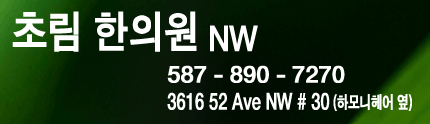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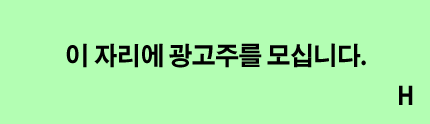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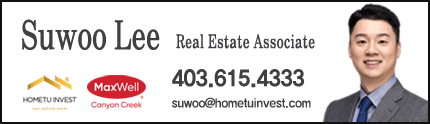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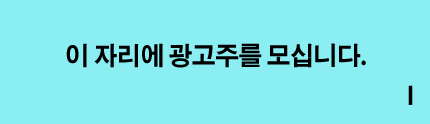
지젝은 작년 만델라 장례식이 끝나고 저의 심기를 또 건드렸었지요 (ㅋ). 저는 지젝의 이런 횡설수설이 맘에 안드는 사람중 하나인거 같아요.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3/dec/16/fake-mandela-memorial-interpreter-schizophrenia-signing
"라깡 정신분석학을 중심으로 현대 정신분석의 이론과 치료요법을 연구함으로써 철학, 정신의학, 심리학, 문학, 문화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한의학, 언론학, 예술, 영화, 법학, 종교학 등 학문의 지평을 넓히고... (후략)"
이라고 합니다. 저로서는 목적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더군요.
어쨌든 이 소쉬르의 언어학에서 기호학이 발전된 것은 분명하고 위에 언급한 사람들이 기호학계에서 자주 회자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호학 개론서인 Daniel Chandler의 [Semiotics: The Basics] (Routledge)에서는 참고문헌 뿐만 아니라 아예 인덱스에서도 촘스키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촘스키의 이론은 기호학에 거의 적용되지 않은가 봅니다. 라캉의 영향을 받는 지젝이 당연히 촘스키와 연관이 없는 것은 사실이구요. 그래서 지젝은 장광설로 유명한 사람같은데, 그를 촘스키가 좋아할리는 거의 확실히 없다고 봅니다.
어떤 연구 대상을 어떤 관점이나 접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영화라는 영역은 기호와 상징들의 연속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이해하는데 기호학이 각광을 받는 것같구요. 사회현상을 사회과학적 이론으로 접근하기도 하지만, 어떤 징후를 빠르게 읽고 해석하는데는 기호학이 중심역할을 하니까 지젝 등이 인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토마님의 경우, 사회과학을 하시니까 지젝이 횡성수설한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가 나름대로 많은 통찰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인기가 있지 않을까요? Jerome Kagan의 [The Three Cultures]에서 이야기 했듯이, 인문학은 사회과학과 다릅니다. 대상이 다를 뿐 아니라 접근법도 다르고, 연구의 범위 한정도 다릅니다. 물론 역사학에서도 통계적 내용이나 다른 사회과학적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을 시도한 사람들이 프랑스 아날학파라고 생각되구요. 요즘은 학계도 분업사회다 보니,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을 통섭할 수 있는 학자는 거의 없죠. 괜히 다른 분야 언급해서 깝죽거리다가 쏘칼 같은 사람한테 쏘가리 칼 맞기 십상이죠. 사회과학하는 사람들이 역사학에 발을 잘 못내디면, 또 비판받을 수 있고요. 아무리 훌륭한 사회과학자도 역사학자들만큼 일차자료나 언어구사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또 컨트롤하기 힘든 역사적 자료를 사회과학적 이론을 적용하다가 환원주의라고 욕먹기 쉽고요. 맑스의 유물사관이 그 고전적 예가 아닐까요?
어쨌든 인문학하는 사람들이 사회과학에 관심갖는 것은 그냥 “읽기”에 그치는 것과 다를게 없죠. 제가 지젝에 훅갔던 것은 캘거리의 어느 강연에서 강연자가 지젝의 master signifiers (주인기표; 시니피앙)를 소개하면서 부터였습니다. 이것은 순수 기호학적 개념이구요. 혹시 이 개념이 제 생각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의 책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도 사둔 것이죠. 개념들은 이론으로 미치지는 못하지만, 현상을 이해하는 굉장한 도구고, 이런 은유는 인문학에서 중요한 열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학, 종교학, 사회학, 문학등의 인문학은 읽는것도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몇몇 대학에서 이들 분야를 없애거나 축소하려고 하는걸 극도로 반대하는 편입니다 (일차자료에 대한 발굴/재해석등은 상당히 흥분되는 분야인것 같기도 하구요) .
아마 제가 라캉, 데리다, 지젝등의 팬이 아닌 이유는 이사람들의 글쓰기가 너무 현학적이고(제기준에), 남들이 안쓰는 말들을 만들어 쓰는 이상한 문화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도킨스글에서 나온말입니다. 다음 단락중 하나는 프랑스의 지성이라는 구아타리가 쓴글이고 다른 하나는 호주의 전산학자가 이들 지성을 놀리기 위해 만든 randomly generated 된 text입니다. 이 전산학자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이런 단락을 순식간에 무한정으로 만들어주죠. 두단락중 무엇이 진짜 철학자에 의해 쓰였다는걸 아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1) If one examines capitalist theory, one is faced with a choice: either reject neotextual materialism or conclude that society has objective value. If dialectic desituationism holds, we have to choose between Habermasian discourse and the subtextual paradigm of context. It could be said that the subject is contextualised into a textual nationalism that includes truth as a reality. In a sense, the premise of the subtextual paradigm of context states that reality comes from the collective unconscious.
(2) We can clearly see that there is no bi-univocal correspondence between linear signifying links or archi-writing, depending on the author, and this multireferential, multi-dimensional machinic catalysis. The symmetry of scale, the transversality, the pathic non-discursive character of their expansion: all these dimensions remove us from the logic of the excluded middle and reinforce us in our dismissal of the ontological binarism we criticised previously.
제가 은유론에 결정적으로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전에도 언급했던 George Lafoff의 [The Political Mind]를 읽고 나면서부터였습니다. 레이코프가 촘스키를 비판한 곳은 이 책의 제 18장 Language in the New Enlightenment입니다. 여기에서 레이코프는 촘스키가 컴퓨테이션에만 관심이 있어서 현대의 인지과학적 연구와 잘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토마님도 시간나면 한 번보시구요. 촘스키의 이론이 영원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기호학의 기본은 해석이죠.
춈스키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언어의 인지적 능력에 대해서는 레이코프의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좀 읽어보니 재밌기도 하지만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쪽에도 잘 모르죠.
그리고 토마님께서 인문학을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문학의 꽃인 역사학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지만 모든 자료는 이미 해석된 자료이고 인과성을 연결하는데는 최소한 허구적인 요소가 가미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그러면 아날학파처럼 정말 재미없는 역사학이 되어 버리죠.
위에 인용된 것 보니까 카프라라는 사람이 말했었는데, 현대물리학의 이론을 설명하는 것하고 고대 인도철학자들이 쓴 것중에 어느 것이 현대물리학자가 쓴 거냐고 물었는데 대부분 반대로 대답했다는 말이 기억나는군요. 실은 뭐, 제가 아는 게 뭐 있나요? ^^
그리고 티모디 윌슨의 Strangers to Ourselves: Discovering the Adaptive Unconscious의 앞부분을 심심풀이로 좀 읽었는데 재밌네요. 전에 Redirect: The Surprising New Science of Psychological Change를 재밌게 읽어서요. 언제 토마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