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아래 댓글달려다가 길어져서 따로 포스트로 올립니다. 이것 저것 두서없이 썼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올림

지난 번에 늘봄님께서 올린 포스트에서 언급하신 Terry Eagleton의 [Culture and the Death of God]를 사서 잘 봤습니다. 저는 원래 새책을 사서 잘 안보는데, 이전에 이글튼의 [Reason, Faith, and Revolution: Reflections on the God Debate]을 재밌게 봐서 늘봄님께서 왜 이글튼의책을 추천하셨는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글튼은 무신론자 도킨스와 히친스를 까고 있었거든요. 이글튼 역시 무신론자면서 도킨스의 문화이해를 명제적 이해에 한정시켰다고 비판하였고, 그에 대한 대안적인 책이 바로 새로 나온 [문화와 신의 죽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른바 계몽주의의 발흥으로 신을 대체했다고 이성주의자들이 비판했지만, 사실 신의 죽음, 즉 기독교문화의 무덤에서, 다시 말해서세속화된 사회에서 이성적인 인간들이 득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민족주의 등 다양한 이념들이 대안으로 등장했다는 것이 이글튼의 주장이라서 늘봄님의생각과 좀 다르지 않은가 싶은데, 그래서 더 흥미롭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적 전파나 문화적 변용(acculturation)에 관심이 많은데, 늘봄님께서 역사적 예수 이후 기독교가 변질되었고, 역사적 붇다이후 불교가 변질되었다고 하셨지만, 사실 그동안의 기독교나 불교의 발전은 수많은 정치적, 문화적, 지역적 변수에 의한 문화접변의 과정에서진화 발전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신화학자 멀치아 엘리아데나 조셉 캠벨보다 불교 등 종교 현상 자체에 대해 더 해박하고 균형잡힌 학자 니니안 스마트(Ninian Smart)는 모든 종교에 순수한 종교란 없다고 하였습니다 . 순수성이란 특정종교에 포함된 사람들의 주장이지 어떠한 종교적현상도 하늘아래 새로운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기독교가 순수한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웃기는 이야기죠.
늘봄님의 종교비판은 도킨스의 종교비판을 닮았는데, 이글튼은 이러한 도킨스적인 시각을 위의 [문화와 신의 죽음] 148 쪽에서 다음과 같이언급하고 있습니다.
““The opposite case — that religion is a set of erroneous propositions or species of bogus science — has been advanced in our time by such old-fashioned 19th century rationalists as Richard Dawkins, who dismisses religious belief without grasping the kind of phenomenon that it is meant to be.’’
어떤 종교든 교리화는 불가피합니다. 교리는 종교적 신념을 논리적, 조직적으로 발전시킨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폴 틸리히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리가 다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접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결코 역사적 예수로 돌아갈 수 없고 , 역사적 붇다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봄님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에서 발전되고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변질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신것은 시간과 공간에서의 종교적 변용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물론 원시적 형태의 예수의 가르침이나 싯다르타의 가르침을 재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신학자 휘오렌자가 여성신학적 재건을 외친 것도 그런 방법 중의 하나겠죠.
그래서 시간나시면, 종교적 내용이 별질되었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러한 변질의 문화적 정치적 변수에 대해서 좀 더 차분히 진술해 주시면 다른 분들도 잘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진화론을 문화에 대입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망설이는 중이지만, 재밌게 읽은 Nicholas Wade의 [The Faith Instinct]나 Robert Wright [The Evolution of God]같은 책들은 원시종교에서 어떻게 현대에 이르기까지 진화해왔는가를설명하고 있습니다. 도킨스 역시 [The God Delusion] 제 5장 “The Root of Religion”에서 야심차게 종교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리적 변질이든 상관없이 종교가 변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인류학자 E. E. Evans-Prichard의 [The Theories of Primitive Religion] 역시 종교적 변질을 설명하기 보다는 종교의 진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형태지만, Rodney Stark의[Discovering God: The Origins of the Great Religions and the Evolution of Belief]은 좀 다른 맥락에서 종교의 진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신을 믿는 현상은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고, 이런 종교현상이 그렇지 않은 현상을 흡수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기 작은세상님께서 영지주의가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에서 주류였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를 보통 유명한 독일의 역사학자 Walter Bauer의 [Orthodox and Heresy in Earliest Christianity]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자료와 연구인 Birger Person의 [Gnosticism and Christianity in Roman and Coptic Egypt]는 바우어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지주의 문헌을 왜 [The Nag Hammadi Library]라고 했을까 무척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전, 어느 사회학자의 영지주의 문헌 연구논문을 읽으면서 그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library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영지주의 문헌 총서 또는 문고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이 영지주의 문헌은 특정 종교집단이 몰래 숨겨 둔 것이라면, 잡다하게 도서관에 책 보관하듯이 모아두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밉니다. 즉, 가설이기는 하지만, 영지주의 문헌은 영지주의를 신봉하는 특정종교집단이 정선한 문서의 콜렉션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당시 지혜를 말하는 운동이 사실 운동이라기 보다는 요즘 뉴에이지나 아니면 신지학 정도의 esoteric tradition에 있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옆으로 샌 감이 있지만, 이른바 중국에서 만개된 대승불교가 원시 불교의 변질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승불교인 테라바다 불교는 빨리어 경전(Pali Canon)에 기초한 원시적 종교형태이고, 후에 싼스크리트의 대중화와 이런 문헌의 중국어 번역으로 인한 대승불교의 발전은 나름대로 사람들의 필요와 대중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해 봐야겠지만, 스탁을 따른다면, 앞으로 종교적 진화는 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 정반대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힌두교 전통에서 신들의 수가 인도의 인구보다 많다고 하지만, 사실 대중의 지지를 받는 신이 살아 남습니다. 캘거리에 힌두사원에 가도 신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중을 잃은 신은 죽고 사라집니다. 물론 진리의 추구는 대중적 인기와 상관이 없겠지만, 종교는 대중화를 통해서 살아남습니다.
* 사족으로 적어도 종교의 발전, 특히 종교 조직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려면, 종교사회학자 토마스 오데아(Thomas F. O'Dea)의 ” 종교제도화의 다섯가지 난제” (Five Dilemmas 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ligion)를 꼭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다섯가지 난제는 종교운동(movements)이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으로 가면서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성서는 종교운동의 초기형태지만, 이미 제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초기에 쓰여진 바울서신서에 봐도 그렇구요. 종교의 제도화나 또는 다른 종교로 지역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변화되는 문제는 진지하에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사족을 더 붙이면, 전통적인 기독교와 가장 대조되는 종교는 테라바다 불교입니다. 개신교와 가장 비슷한 불교는 정토종이죠. 일본의 신란의 정토종 개혁 이후, 정토종에서 승려가 결혼한 것은 바로 루터가 가톨릭을 떠나 수녀와 결혼을 한 것과 맞먹는 겁니다. 가톨릭의 행위의 구원 대신에 은총의 구원을 루터가 강조했듯이, 일본의 정토종도 그런 경우구요. 정토종(淨土宗; Pure Land Buddhism)은 타력구원을 대표하며, 열반이 정토로 대체됩니다. 추상적으로 정리하면 그렇다는 말씀이구요. 정토회 홈페이지 가보면, 정토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냥 "맑은 마음, 좋은 벗, 깨끗한 땅을 일구는 정토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린다는 말씁입니다. 제가 이분이 캘거리에 오시면 질문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정토회와 종토종의 전통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구요. 만일 정토회가 정토종적 전통에 있다면, 늘봄님의 역사적 붇다, 역사적 예수 추구와 배치됩니다!!!
오데아의 이론을 잘 요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조하시구요.
http://hirr.hartsem.edu/ency/O'Dea.htm
http://web.pdx.edu/~tothm/religion/Dilemmas.htm
* 위의 내용을 좀 수정합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TaJ7A6Y5g6k#t=562
법륜스님의 정토사상에 대한 유투브 강연입니다. 정토는 타방정토, 유심정토, 미래정토로 설명을 하시는군요. 즉, 법륜스님은 정토사상을 견지하시는 분으로 생각되구요.어쩌면 한국불교는 선불교전통도 강하지만 법륜스님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정토사상이 강하게 들어 있는 것같습니다.
윤회의 문제는 잘 모르지만, 법륜스님께서 잘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늘봄님께서 윤회의 인과율은 아트만의 힌두교 전통에 기인해서 이해하셨던 것이라고 봅니다. 법륜스님께서 윤회사상은 인도불교에서 묻어왔다고 하셨는데, 제 식으로 이해하자면, 근본불교는 아나트만(무아)의 개혁이고, 이러한 아나트만의 개혁은 윤회의 인과율과 정면으로 배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무아사상을 강조하면서 인과율을 말한다면 논리자체가 모순되는 것이라고 보구요. 그런데 윤회사상을 완전히 부정하면 불교의 연기법이 문제가 될 것같고, 무아사상이 지나치면 인식주체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는 불교에 대해서 무지한 저로서는 여전히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른바 대승불교에서 중관불교와 유식불교가 갖는 존재론과 인식론의 갈등은 우리같은 초보는 영원한 수수께끼죠. 공과 무아를 이야기하면서 인식주체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인식주체의 문제를 강조하면, 공과 무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요? 어째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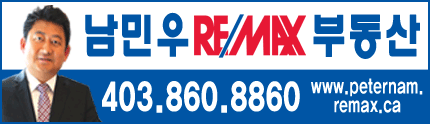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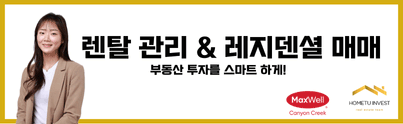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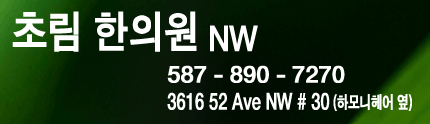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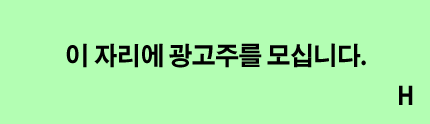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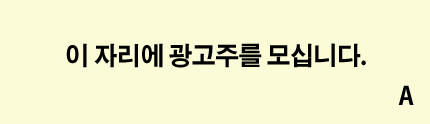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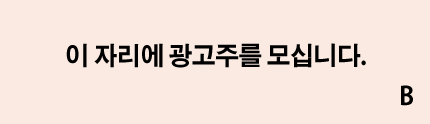

스님도 한국 불교의 전통 선상에 있어서 정토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못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싶습니다. 가령 정토법당에서 모시는 불상이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석가모니불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듯 정토회나 법륜 스님의 지향점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부분에는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제인가 사후가 궁금하다는 노인에게 좀 이따 죽어보면 다 알텐데 뭐가 궁금하냐는 답변을 하던 동영상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잘 살아 왔으니 오늘이 괜찮고 오늘이 괜찮으니 내일도 괜찮고 내일이 괜찮으면 사후도 좋다고 하더군요.
선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깨어 있으라는 것인데 제가 보기엔 법륜 스님은 이와같은 선불교 전통 선상에 있는 분이 아닌가 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