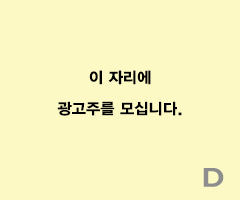송구 영신
내가 너를 맞을때
세탁해 갈아 입었던 옷은
이 해 저녁이 다 저물어
달이 새롭게 하늘 물에 말끔히 씻은 얼굴로
내일의 만남을 전언해 오도록
아무런 감흥도 없는
흐릿한 낡은 옷이었네
사철 걸친 무채색 옷으로
나는 그저 어느 색에도 물들지 않고
어느 상처에도 눈물 없이
봄 가을 핀 철꽃 한 웅큼 묶어
아픈 병상 머리맡에 놓은 일 없고
여름 겨울 눈 비 맞은 이마
닦아 준 일 없는 소매자락 흔들며
나 사는 일에만 분주한 일상으로
저녁의 마을을 지나
다시 신 새벽의 해를 맞게 되었네
무사 안녕의 강을 넘실넘실 넘어 온
한 마디 덕담의 혀에게
내 살아 온 햇수 만큼의 수치와 죄의 무게는
분명 바닥 깊게 박혔거늘
무슨 얼굴로 또 너를 맞을 것인가
그리해도
다시 후회의 옷 벗어 들고
세탁실의 계단을 밟으며
새해에는
새해에는
허공에 약속을 던져 본다네.
|
|||||||||||||||||
|
|||||||||||||||||
| 송구 영신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