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늘봄님의 포스트에서 번영님의 질문에 대한 늘봄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 요즘 “soul”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의 문제제기는 실종된 상태로 말이죠. 영혼에 대한 것은 제가 촉발한 것은 맞지만, 이것은 저의 글을 완전히 오도한 것입니다. 제가 제기한 문제는 “영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늘봄님은 예수는 무신론자였고 이원론을 부정한 일원론자였다는 주장이 본인이 참고했다는 그레고리 라일리의 책 [The River of God]는 늘봄님의 이러한 주장을 완전히 뒤엎다보니 아마도 당황하셨나 봅니다. 신학에 경도된 이들의 위험은 본인의 신학적 입장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는 것이죠.
https://cndreams.com/cnboard/board_read.php?bIdx=1&idx=15479
사실 라일리는 나름 진화론적 입장에서 종교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소박하게 설명하고자 한 성서학자죠. 그는 서론에서 종(species)은 환경이 부과하는 방향으로 변한다는 것이고, 이 환경에 적응하거나 아니면 소멸한다 (they adopt or die)는 테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응의 한 개념으로 그는 “punctuated equilibrium”을 소개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단속 평형이론(斷續平衡理論)으로 번역하는군요. 종의 진화는 변화없는 긴기간이 지속되다가 환경의 위기가 초래한 비교적 빠른 변화의 순간의 평형상태를 의미한다 (믿거나 말거나)고 합니다. 이런 평형상태가 지엽적으로 발생했을 때 이런 틈새 (niche)에서 새로 적응한 형태가 적응하지 못한 조상의 후손과 공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진보 (Progress)는 점진적이 아니라 환경의 위기에 빨리 반응하여 적응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짧은기간에 일어난 평형 이론이 종교의 진화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했느냐 성공했느냐는 이 글의 논지가 아니라 라일리가 초기 기독교 환경을 설명하는데 나름 진화론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데 방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자연과학 이론이나 개념을 인문학에 적용할 때 위험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죠. 괜히 잘 못 이해하고 적용해서 쪽팔릴 확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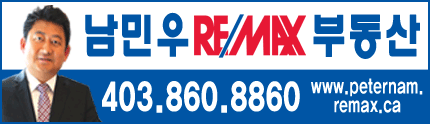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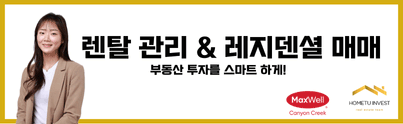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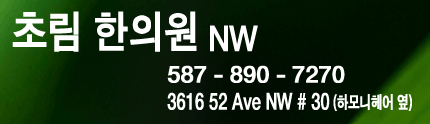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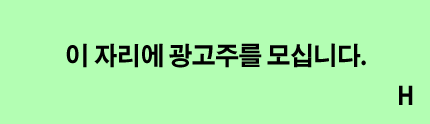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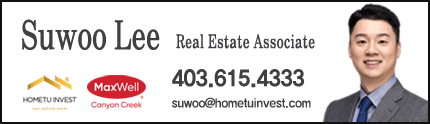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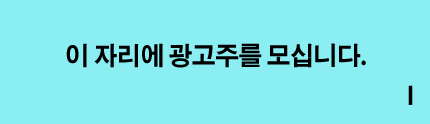
올리신 훌륭한 글과 음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올리신 글의 라인과 라인 사이에 공간을 좀 더 주시면 독자분들께서 읽기가 훨씬 쉬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에 올리신 글을 카피-> 페이스트 -> 라인과 라인 사이에 공간을 훨씬 넓혀 읽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고, 좀 감정적으로 드라마틱한 음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종교가 감정(emotion)이듯, 음악도 감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 명상에 들어가면 마치 영혼이 존재한 것처럼 느껴지듯, 음악을 들으도 영혼같은 것이 존재하는 듯 느껴집니다.
그리고 위의 음악의 숲그림에 비친 두 인물처럼, 타자와의 만남을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교나 시문학에서 신인동형 (anthropomorphism)이나 의인화 (personification)가 모두 인기가 있죠.
제가 몇개월 전에 '효과적인 소통의 요소' (Keys to Effective Communication) 수업을 들었는데, 웹사이트
에 글을 올리거나 이메일을 쓸 때, 글 크기는 11- 14까지를 추천하고, 라인 간격은 1.5- 2 를 하는게 좋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종교와 음악은 철저한 원리와 법칙으로 구성된 과학을 기반으로 하며, 그 위에서 감정(emotion)을 세세하고 좀 더 정
확하게 표현하는 방법(것)이라고 배웠고, 경험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글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또는 다른 이미지를 주고 싶다면 다른 폰트를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