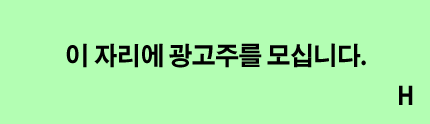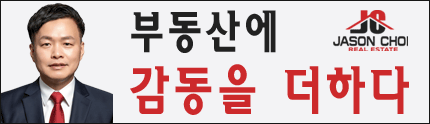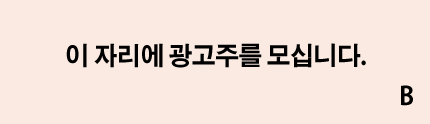두 번째 자전거를 산 것은 결혼 후였다.
약해빠진 사이클에 데인 이후로 튼튼해 보이는 자전거를 골랐다. 뭐 대충 유사 MTB 다. 운동 삼아 동네 마실을 다니다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기로 결심했다.
탄천을 끼고 달리다가 강변으로 해서 삼성동에 있는 회사로,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했다. 탄천을 달릴땐 자전거길 위에 구름처럼 떼지어 있는 하루살이 무리를 지나칠 때가 많았다. 날벌레들이 얼굴에 와다다다 부딪쳤다. 헉헉거리며 호흡할 때 하루살이들이 코로도 들어오고 입으로도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었다. 아마 여러 마리 먹었을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출퇴근 길이었다.
하지만 이 즐거운 출퇴근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을 해서 자전거를 묶어놓고 술에 취한 채 집에 갔는데, 다음 날 출근을 해보니 자전거가 사라졌다. 밤새 누군가가 훔쳐간거다.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 코엑스 근처로 전시회를 보러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전시회가 끝나고 나와 보니 자전거가 사라져 있는 등 난리도 아니었다. 그래서 자전거는 항상 잊어버려도 아쉽지 않을 정도의 가격대인 10만원대로 주로 샀다.
칼바람이 쌩쌩 부는 한겨울에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곤 했다. 방한모를 쓰고 귀마개를 하고 바라클라바를 쓰는 등 중무장을 했다. 그런데 겨울 자전거 라이딩의 가장 큰 적은 눈알이 시리다는 거였다. 그래서 방풍 안경까지 쓰고 자전거를 탔다.
직급이 올라가고 회사에 개인 공간이 생겼다. 드디어 자전거를 회사의 내 방에 갖다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자전거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다. 타고 다니는 자전거도 좀 더 고급이 되었다.
그런데 큰 자전거를 들고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는게 고역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너무 보였다. 결국 자전거를 번쩍 들고서 5층 사무실까지 계단을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 귀찮았다. 마침 그 당시 유행하던 접이식 미니벨로를 사봤다. 보기보단 다르게 주행성능이 훌륭했다. 미니벨로로 출퇴근을 시작했다. 회사 앞에서 척척 접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씩 자전거를 접고 펴고 하는게 또 귀찮아졌다. 결국 좀 타협을 하기로 했다. 차 뒷좌석을 폴딩 한 후 가지고 있던 MTB 와 미니벨로를 실었다. 회사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MTB를 꺼내 타고 퇴근했다. 다음날 아침 대중교통으로 출근했다. 그리고 다시 지하 주차장에서 미니벨로를 꺼내 타고 퇴근했다. 다음 날 대중교통으로 출근한 후 차를 가지고 퇴근했다. 다시 두 대의 자전거를 차에 싣고 회사로 출근했다.
이 루틴은 회사를 사임 하기 전까지 이어졌다.
이 모든 자전거 출퇴근에 관한 추억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간은 신혼 때였다. 나는 사내 연애 했고 사내 결혼했다. 결혼하고도 오랫동안 아내와 같은 직장에 다녔다.
결혼한 후 초창기에 산 자전거 중 하나는 굉장히 이상했다. 프레임에 뒷바퀴 충격 흡수를 위한 쇼바까지 달렸는데 짐자전거처럼 큼지막하고 튼튼한 짐받이도 달려 있었다. 최첨단 자전거처럼 생겼으면서 짐차로도 쓸 수 있는 요상한 물건이었다.
어느 날 아내가 자기를 뒤에 태우고 같이 퇴근하자고 했다. 내가 자세를 잡은 후 아내가 짐받이 옆으로 걸터 앉았다. 아내를 뒤에 태우고 강변도로를 질주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롤러블레이드 열풍이 불고 있었다. 강변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뒤쫓거나 따라잡으며 아내와 같이 달렸다. 둘이서 하나의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도 끊임없이 뭔가 얘기를 했던 것 같다. 바람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면서도 '뭐라고? 어쨌다고?' 라고 서로 소리치며 한강변을 달렸다.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행복해진다.
여러 달 후 그 이상한 자전거를 도둑맞았다. 그 이후에 산 자전거들은 아내를 뒤에 태울만한 짐받이가 없거나 튼튼하지 못했다. 요즘 타고 다니는 미니벨로는 아예 사람을 뒤에 태우는게 불가능하다.
아내를 뒤에 태우고 한강변을 달리던 그 시절이 그립다. 나는 롤러블레이드를 타는 사람들을 주의하며 페달을 밟았고, 아내는 내 허리춤을 꼭 잡거나 나를 뒤에서 부둥켜 안고는 했었다. 그렇게 둘이서 하나가 되어 강변을 달렸다. 찬란했던 20대의 막바지 청춘을 그렇게 보냈다. 행복한 추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