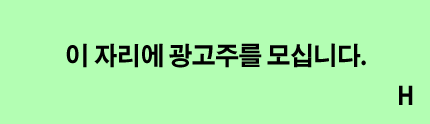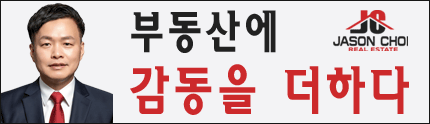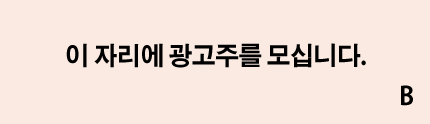캐나다 서부의 에드먼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평원과 단풍에 둘러싸인 젊은 도시에서 사람과 자연의 이야기를 듣는다.

빅토리아 공원(Victoria Park)에서 남쪽으로 바라본 에드먼턴의 스트라스코나 지역. 왼쪽의 하이 레벨 다리(High Level Bridge)는 1913년 완공됐다. © 허태우
어느 외딴 도시에 오다
창밖 풍경이 광활하다. 밴쿠버(Vancouver)를 출발한 비행기는 로키 산맥을 넘어 날고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나라의 대지는 동쪽으로 끊임없이 뻗어나가 인도양과 맞닥뜨릴 텐데, 그 사이에는 초원과 황무지, 호수와 동토가 뒤섞여 있을 것이다. 저 먼 곳 아득히 보이는 지평선으로는 그 실체를 알 수 없지만 말이다. 눈 아래의 평원은 바둑판처럼 격자로 질서 정연하게 나뉘어 있다. 마치 거대한 거인이 차곡차곡 갈아놓은 논밭, 혹은 외계인이 색다른 형태로 만든 미스터리 서클 같다. 수십 개의 거대한 사각형 위를 지나던 비행기는 V 형태의 공항에 착륙한다.
앨버타의 주도 애드먼턴(Edmonton).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북쪽에 자리한 대도시(인구 100만 명 이상 기준)이자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가을 한복판에 들어선 에드먼턴은 온통 황금빛으로 뒤덮여 있다. 도시를 관통하는 노스 서스캐처원 강(North Saskatchewan River) 주변으로 빽빽하게 늘어선 단풍나무가 발산하는 빛이다. 이 지역의 단풍은 캐나다 동부와 달리 대부분 황금색을 띤다. 페이스트리의 속살처럼 겹겹이 쌓인 단풍 위로는 다운타운의 고층 빌딩이 비죽비죽 솟아 있다. 전체적인 도시의 모습에서 원숙함보다 풋풋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도 그럴 것이 에드먼턴은 1904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시의 지위에 올랐다. 캐나다의 모든 도시도 사정은 비슷한데, 유럽이나 아시아의 고도에 비하면 수백 년이나 젊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나라는 런던이나 서울에 비해 아직 한참 어리다. 이제야 인생 전반부의 몇 장만 완성했을 뿐이다. 그들이 앞으로 채워가야 할 역사의 페이지는 998만 제곱 킬로미터의 국토만큼이나 넓은 셈이다.

초기 에드먼턴 이주민은 주택이 부족해 천막에서 생활했다. © 허태우
강가에 카우보이가 왔던 때
애드먼턴의 시작은 서스캐처원 강변의 작은 모피 교역 기지였다. 원주민과 교역을 위해 모험심 강한 무역상과 카우보이들이 정착해 작은 마을을 이루었다. 원주민은 주로 비버 가죽을 가져왔고 무역상들은 그 대가로 두툼한 블랭킷이나 생필품을 지불했다. 그러다가 철도가 연결되어 마을 규모가 점점 커졌으며, 클론다이크 골드 러시(Klondike Gold Rush, 캐나다 유콘 주 북서부 일대 금광의 전성기) 시기에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수만 명의 사람이 에드먼턴에 밀려 들어왔다. 그때는 주택도 부족해 많은 이가 천막을 치고 생활했다.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 아일랜드, 폴란드 등에서 온 이민자는 척박한 땅을 묵묵히 개척해 터전을 일궜다. 더 드라마틱한 변신은 1940년대 찾아왔다. 도시 인근에서 유전을 발견한 것이다. ‘캐나다 석유 산업의 수도’라는 별칭처럼 막대한 자금과 산업 시설이 들이닥쳤다. 그 후 지금까지 별 탈 없이 도시가 자라왔으니, 에드먼턴이 석유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해도 될 듯하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곳의 NHL 하키팀은 오일러스(Oilers)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포트 에드먼턴 파크(Fort Edmonton Park)에서는 모피 교역에서 시작해 20세기 초반까지 도시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1846년, 1885년, 1905년 그리고 1920년. 각 시대별로 거리와 마을의 모습을 재현해놓아 불과 몇 분 만에 십 수년을 넘나드는 듯하다. 증기기관차가 지나가면 클래식 자동차가 뒤따라 오고, 잠시 후 세간을 실은 짐마차가 털털거리며 사라진다. 1920년대 호텔과 극장을 지나치면 초기 정착민의 천막촌이 나오고 모피 교역소와 요새까지 등장한다. 식료품점이나 보석 상점에서는 시대와 어울리는 의상을 입은 주인이 손님을 맞이한다. 공원 안 셀커크 호텔(Selkirk Hotel) 1층의 마호가니 바(Mahogany Bar)에서 구식 칵테일을 주문해 마시다보면, 술집 문이 활짝 열리며 리볼버와 산탄총으로 무장한 갱단이 나타날 것 같다. 공원 입구로 되돌아오기 전까지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순간을 몇 번이나 겪게 된다. 실제로 이곳에 들어선 건물과 부대시설의 약 80퍼센트가 진짜라고 한다. 그만큼 역사의 한 장면을 능숙하게 재현해놓은 것이다. 비록 1920년대 바에는 총잡이 대신 구레나룻을 기른 연로한 노인이 조신하게 입장하고 캐피톨 극장(Capitol Theater)에서 열리는 컨트리 음악 공연에서는 주로 커버곡을 열창하지만 말이다.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현실과 역사의 교차는 또 다른 장소에서도 펼쳐진다. 시내에서 빠져나와 30분쯤 평원을 달리면 도착하는 우크라이나 문화유산 마을(Ukrainian Cultural Heritage Village)이 그 무대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출신 이민자가 겪어온 일상의 편린을 통해 그들의 역사를 세심하게 알려준다. 역사 박물관부터 연구 기관, 초기 이주민의 생활을 재현한 마을까지 갖춘 타임캡슐 같은 곳이다. 우크라이나 인은 1892년부터 앨버타 주에 이주해 캐나다의 기틀을 닦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통치를 받던 우크라이나는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제대로 된 농지를 찾기도 어려웠다. 반면, 캐나다에는 우크라이나 영토가 몇 개나 들어오고도 남을 땅이 있으나 인구가 부족했다. 앨버타 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 정책을 꺼내 들었다. 토지 제도를 손보고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인 것이다. 우선 타운십 시스템(Township System)이라는 제도로 내륙 지역을 사각형으로 나눠버렸다. 40에이커(약 16만1,900제곱미터)의 사각형 토지 4개가 모이면 160에이커의 사각형 토지가, 그게 4개 모이면 640에이커 크기의 사각형 토지가 됐다. 타운십은 640에이커 토지 36개로 이뤄진 일종의 개척용 마을 단위다. 무척 단순해 보이나, 인적조차 없는 넓은 대지를 관리하기에는 효과적이다. 이 시스템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다본 앨버타 주의 평원은 바둑판 모양이다. 토지 제도를 정비한 후에는 사람들이 살아갈 일만 남았다. 그렇게 넓은 사각형의 땅만 휑뎅그렁하게 존재하는 곳으로 누가 들어 갔을까. 바로 이주민들이다.

1930년대 모어컴브 학교와 선생님. © 허태우
“3년 동안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살면 160에이커(약 64만7,500제곱미터)의 땅을 무상으로 줬어요. 어렵게 살아가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꿈같은 기회였습니다. 척박한 땅을 일궈 농사를 짓는 일은 우크라이나에서도 자주 겪던 일이어서 도전해볼 만했죠.” 데이비드 머코스키(David Makowsky)가 설명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우크라이나 이민자의 후손으로, 문화유산 마을의 홍보 담당자다. “1930년대 약 1,700명이던 캐나다의 우크라이나계 인구는 오늘날 12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앨버타 주에서는 가장 큰 유럽 이민자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죠. 이곳에서는 그 역사를 알려주고 있고요.” 마을을 거니노라면, 우크라이나 전통 목조 가옥과 그리스 정교회 건물도 보이고 목재상과 곡물 창고, 간이역도 보인다. 앨버타 주 곳곳에 남아 있던 20세 초 건물을 옮겨와 복원한 것이다. 고증에 따라 외관뿐 아니라 실내의 가구 배치까지 완벽히 재현했다. 단순한 ‘민속촌’을 뛰어넘은, 살아 있는 박물관이다. 심지어 그 안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도 1930년대 이주민과 똑같다. 만약 집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어떤 이에게 “저기는 누구의 집인가요”라고 묻는다면, 우크라이나 억양이 물씬 묻어 있는 말투로 “작은 아버지의 집인데,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작년에 이 집으로 왔어요. 돈을 벌려고요”라고 능청스레 답해줄 것이다. 100퍼센트 연기라는 사실을 알아도 헷갈릴 만큼 사실적이다. 게다가 그들이 일상처럼 들려주는 이야기는 공감을 부른다. 이민자의 삶과 캐나다의 문화가 은연 중에 담겨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들을 향한 연민과 감탄의 감정마저 자연스럽게.
글 ・ 사진 허태우